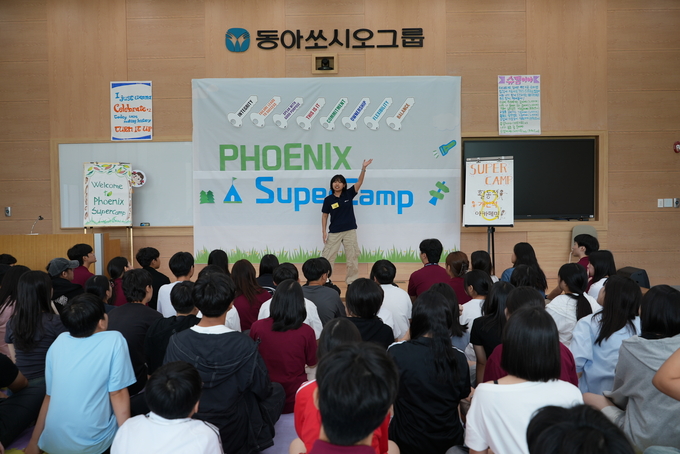김희운, 시조시인

어린 시절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가운데 ‘가훈 써오기’가 있었다. 가훈은 풀이 그대로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이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멋들어 보이는 가훈이면 좋은데, 무얼 써서 갔는지 기억이 없다.
우리 아이들 숙제도 같았다. 가훈을 정해야 했다. 완전히 실행하지는 못해도 하고 싶은 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싶었다. 힘들게 살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자’라 정해 숙제도 해결하고, 거실 가운데 떡하니 걸었다. 우리 아이들은 즐기기도 놀지도 못하고, 맨날 노력만 한다고 푸념하며 컸다.
매주 지인들과 산행을 한다. 힘든 산행을 함께하다 보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그래서 세 사람이 걸으면 스승이 있다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베풂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이웃들에게 무엇이든 주기를 좋아하는 이씨와 주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박씨가 일화를 소개한다.
가훈을 써가는 숙제에 “우리 집 가훈은 ‘더 많이 웃자, 더 많이 배우자, 더 많이 베풀자’라고 하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 그 말에 초등학생 아들은 “알았어요, 그런데요, 베푸는 것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에요?”라며 되묻는다.
자전거와 물총을 바꾼 아들에게 “자전거는 비싼 물건이고 물총은 비싸지 않은데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라 하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빠, 우리 집 가훈이 ‘웃으며 베풀며’이잖아요.”라 대꾸한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베풀다’란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라고 한다. 또 ‘나누다’란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감상의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다.
베풂이든 나눔이든 나의 작은 행위가 이웃의 선행으로 조금씩 번져간다면 우리 사회에 웃음과 편안함을 주게 될 것이다. 베풀고 나누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도 행복을 되돌려 준다.
불교 용어 중 베풂과 나눔의 공덕을 뜻하는 ‘보시’(布施)가 있다. 이는 남에게 베풀거나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준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기꺼이 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떠한가? 당장은 없어서, 힘들어서 나누지 못한다. 여유가 생기면 힘든 지난날 생각에 아끼느라 나누지 못한다. 베풂과 나눔은 물질적인 여유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준비돼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 따라 돈이나 물건, 지식이나 기술, 봉사, 부드러운 미소나 착한 마음 등 베풂과 나눔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제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부터 실천해 보자.
![[생활에세이] 등반가와 사고의 훈련](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4040017741_46194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