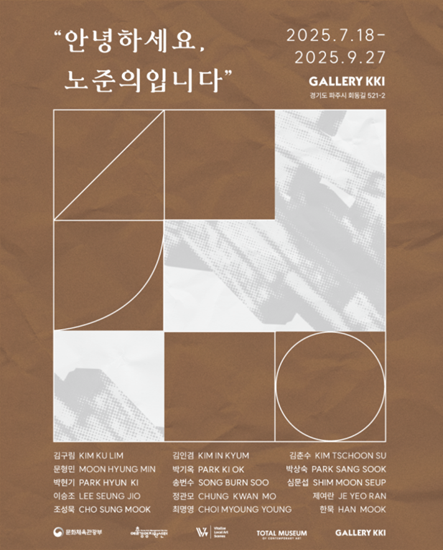현악과 목관, 금관과 타악이 축제 같은 음색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라벨 관현악곡 ‘스페인 광시곡’의 마지막 4악장 ‘페리아’. 대규모 오케스트라인데 지휘자가 없다. 악장 스베틀린 루세브의 바이올린이 역동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조성현의 플루트, 조인혁의 클라리넷, 유성권의 바순이 돋보이고 손열음은 건반 타악기인 첼레스타를 연주하고 있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있었던 고잉홈프로젝트의 공연 풍경이다. 이들의 탄생은 2018년 평창대관령음악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예술감독 손열음이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악장·수석·단원들을 불러 모아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조직했다. 악단의 별명이었던 ‘고잉홈’이 현재 명칭이 됐다. 2020년 코로나로 지휘자를 초청하지 못했을 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해 베토벤 교향곡을 시작으로 2022년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2023년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2024년 베토벤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지휘자 없이 해냈다. 올해는 라벨 탄생 150주년을 맞아 관현악곡 전곡과 실내악 연주를 진행했다.

지휘자 없이 민주적인 앙상블을 표방한 단체로는 뉴욕의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떠오른다. 1972년 창단, 단원 모두가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한다. 호주 체임버 오케스트라, 암스테르담 신포니에타도 지휘자 없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은 실내악단이나 현악 앙상블에 가까워 편성이 작다. 낭만주의 시대 이후 관현악곡이 복잡해지고 편성이 커지며 지휘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고잉홈프로젝트도 2022년 브루크너 교향곡 6번에서 후안호 메나를 지휘대에 세웠다. 작년 12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할 때는 합창단원 중 한 명이 나와 합창단을 지휘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지휘자가 없으면 단원들의 책임도 늘어난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연주에 임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른 악단에 비해 2.5배 이상의 리허설 시간을 요한다. 라벨을 연주하던 그날도 맞은 편 단원에게 손으로 신호를 주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지휘자가 없으면 즉흥성이 빛을 발할 것 같지만 오히려 단원들끼리 ‘약속된 플레이’를 할 때가 많았다. 지휘자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나눈 흔적이 역력했다. 음악애호가들 중에는 ‘저럴 거면 그냥 지휘자를 쓰지’ 하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지휘자를 쓰면 고잉홈프로젝트 고유의 개성은 희박해진다. 이번 라벨 연주에서 앙상블을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며 생긴 근육이 점차 단단해지는 징후가 보였다.
올해 고잉홈프로젝트는 고양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됐다. 코로나가 던져준 시련으로 시작했던 이들의 실험이 K클래식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