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위기관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 늘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임원들이 모여 심각하게 회의를 거듭하지만, 정작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고객센터 상담원, 세일즈 담당자, 이들의 경험과 통찰이 회의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정은 어김없이 현장과 어긋난다. 그렇게 2차, 3차 위기가 시작된다. 위기관리를 위한 결정이 새로운 위기를 낳는 아이러니다.
정책 수립도 다르지 않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과 대내외 경제의 변동성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세우는 일은 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틀에 갇혀 있고, 새롭게 떠오른 기술과 서비스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시장에 나오지도 못한 채 사라진다. 무엇이 이 벽을 넘게 할 수 있을까.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답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규제 샌드박스는 좋은 예다.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던 2016년, FCA는 기존 금융 규제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규제를 무턱대고 없애기보다는, 기업들에게 제한된 환경에서 신기술을 시험할 기회를 주었다. 기업이 시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실증하고, 그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며 규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구조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168개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 진입했고, 참여 기업들은 기존보다 50% 이상 더 많은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모델을 실험한 질치(Zilch)는 그 대표적 사례다. 기존 규제의 틀에서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던 질치는 FCA 규제 샌드박스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시험했다. 실증 결과, 400만 명의 고객과 20억 달러 기업가치를 가진 회사로 성장했다.
한국도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인공지능(AI) 분야만 봐도 그렇다. 수년 전부터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AI 활용에 관한 규제와 정책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오랜 논의 끝에 인공지능기본법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보다 한참 앞서 달리고 있다.
단지 AI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산업, 모빌리티, 원격의료 등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혁신은 시장에서 앞서가고, 규제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왜 이토록 우리의 정책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할까.
결국 답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누구보다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반응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존재다. 그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정책에 담아냈다면, 이렇게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야합’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적 정서에 갇혀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수용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특혜’, ‘재벌 편들기’라는 비난이 발목을 잡는다. 결국 귀를 닫고 안전한 길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을 버려야 할 때다. 혁신 기술이 시장을 이끄는 시대, 정부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야 한다. 기업과의 협력은 야합이 아니라, 혁신을 현실로 만드는 동반자 관계다.
규제는 시장을 지키는 울타리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된다. 울타리는 지키되,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낼 유연성이 필요하다. 기술과 시장, 정책과 규제가 함께 움직일 때, 혁신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사설] 국가AI센터, 정부가 통크게 책임져라](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8/news-a.v1.20250508.1aa6fc71c5b6448c889610bc1b504ec9_T1.jpg)
![[ET시론]추격·추락·추월의 대전환 시대, '기술사업화 모멘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6/news-p.v1.20241126.eeeac18ff60f4aa59b89dffd59a06faa_P3.jpg)
![[비즈 칼럼] 치열한 미래 에너지 패권,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 강화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6bbe4afd-a373-4f9b-ac68-ba79bcf7ac4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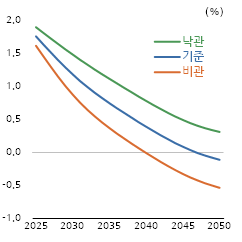
![[기고] ‘기술유출 못 막는 산업기술보호법’ 왜 방치하나](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19484.jpg)
![[사설] 삼성전자 8년 만에 M&A, 규제 철폐로 신성장동력 키울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SWHR7B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