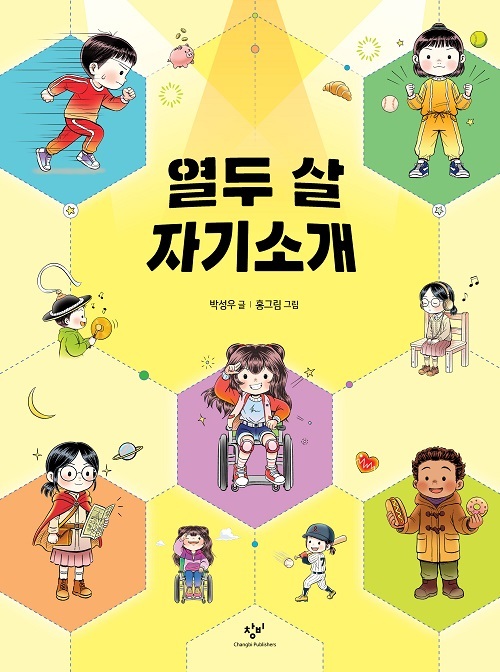전시의 학교생활이 오죽했을까? 교사(敎師)의 사정이 어려웠다. 국어 시간에 영어 교사가 들어오고 생물·물리·화학은 한 분이었다. 다행히도 피난민 가운데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 학업을 겨우 유지했다.
그 가운데 한국 현대사의 전설이 된 박창화(朴昌和) 선생님은 내 일생의 등불이었고, 보성학교 미술·서예 교사였던 이훈종(李勳鍾)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수복한 뒤에는 국문학사에 일가를 이루셨다. 서울중앙방송국(HLKA)의 아나운서였던 한 선생님은 연극반을 지도하여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여러분 가운데 내 머리와 가슴에 가장 깊이 각인된 분은 영어 교사였는데 학력이나 이력을 알 수 없는 분이었다. 이제 돌아보니 아마도 미군 군속이었던 것 같고 발음은 남부의 흑인 사투리였다. 그분이 교실에 들어오면 아이들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다. 두번째 시간 때였다. “오늘 수업은 Lesson 2, 발음을 들려주겠다. Every morning I do this. I washed my hands and…. 누가 읽어 볼까?” 철수가 읽고 나면 번역을 해준다.
그것으로 Lesson 2의 수업은 끝났다. 20분도 걸리지 않는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났다. 남은 시간에는 신체의 부위를 가르쳐주겠다.” 그리고서는 다음 시간에 위로부터 head(머리), 코(nose)…toe(발가락)까지 내려가면 수업이 끝난다. 그다음 수업에는 질병·꽃·나무·군대·가족으로 이어진다. 전국 중학생 가운데 충수염(맹장염·appendicitis)을 아는 학생은 괴산중학교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가 이나마 사람 구실을 하며 사는 것은 영어 덕분이었고, 그 계기는 그 선생님이다. 그러니 한 교사의 생각이 꿈 많은 소년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가? 지금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저 영롱한 눈망울에 조국의 미래가 달렸으니 보람을 가지고 더 정진하시기를….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