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제조업 핵심 과제
#지난달 11일 경북 포항의 포스코스틸리온 공장.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포스코DX 한승연 프로가 철강 코일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3차원(3D) 공간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공지능(AI) 연구원인 한씨는 센서를 설치할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경기도 판교에서 4시간을 달려 포항에 왔다. 그는 “현장의 복잡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공장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에 AI를 도입해 공정을 혁신하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중후장대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AI 개발이 눈길을 끈다.
포스코DX가 개발한 ‘AI 무인 크레인’은 제철소 작업자가 철강 제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크레인을 수동 조작해 옮기는 과정에 AI를 접목했다. 코일(선재)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거나 후판이 불규칙하게 적재된 경우에도 크레인 고리(후크)를 어디쯤에 걸어야 할지 등을 AI가 스스로 판단해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나른다.
두산그룹은 13일 건설기계와 발전기기 등 주요 사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피지컬AI 혁신 담당 부서(PAI 랩)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의 지게차가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거나, 두산에너빌리티의 발전소 장비들이 스스로 에너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AI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계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 HD현대로보틱스는 정밀 용접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정밀 용접은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미세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도의 손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인데 이를 로봇에게 맡긴다는 거다.
AI의 공정 혁신 효과를 키우려면 AI를 각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모델로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대다수 제조 공장은 햇빛·먼지·열기·습기 등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태양광 세기나 조도 변화는 제품의 반사광에 영향을 미치고 AI 카메라의 거리 인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윤일용 포스코DX AI기술센터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기계에 AI를 탑재한 ‘피지컬 AI’는 다양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상환경 시뮬레이션과 현장 테스트를 병행하면서 센서와 제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 공장의 가연성 가스 배출용 굴뚝(플레어스택)을 AI CCTV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도 수많은 변수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AI에 학습시키는 게 중요했다. LG CNS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AI가 이상 징후로 오인해 오작동할 수 있다”며 “주·야간, 계절, 날씨별 데이터를 보완하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에서 AI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딘 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중견 제조기업 16만3273곳 가운데 공장에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0.1%에 불과했다. 향후 AI를 도입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6%에 그쳤다. 대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경제포럼이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제조 혁신을 주도하는 ‘등대공장’을 선정한 기업 수만 봐도, 올해 누적 기준 한국은 5개에 그쳤다. 중국(78개), 인도(16개), 미국(13개) 등과 격차가 크다. 배석주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술 개발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함께 뒤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고] 실무 현장에 필요한 비즈니스용 AI 프롬프트 템플릿 설계 중요성](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013ad064d9f345ae895d3662a82e5fc2_P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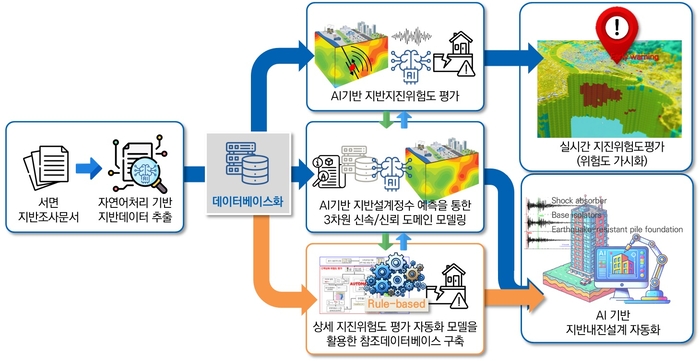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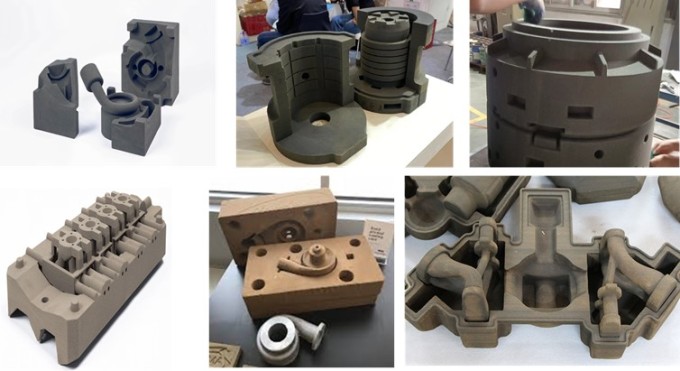

![[뉴스줌인] SK그룹, 반도체 인프라 '수직계열화'…AI 사업은 '집중력' 강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3/news-p.v1.20250513.572f495146354874b2a34e2157711b55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