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는 노름꾼, 그가 행복한 때는 만취했을 때뿐, 어머니는 바느질로 내 청바지들 만들어 주셨지.” 올드 팝 ‘The house of rising sun’ 가사의 일부다. 미국의 전래민요로 뉴올리언스의 노동자들이 술 한잔하면서 부르던 노래.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수많은 가수들이 불렀다. 그중에서 1964년 영국 록 밴드 ‘애니멀스(The Animals)’가 부른 것이 가장 유명하다. 70년대 한국에서도 ‘해 뜨는 집’이란 제목으로도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당시 서울거리에는 ‘해 뜨는 집’이란 이름의 술집, 다방이 즐비했다고 한다. 연전엔 공중파 드라마로도 등장했다. 하지만 70년대 초 한동안 방송 및 음반판매가 금지됐다. 가사가 너무 퇴폐적이란 게 이유다. 특히 아버지를 지나치게 폄하한 것도 이유가 된다.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에서 아버지는 노름꾼, 주정뱅이, 폭군 등으로 등장한다. 아버지는 이처럼 거개가 부정적으로만 묘사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머니를 기리는 헌사는 인간사에 차고 넘친다.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니를 얼싸안았다”는 노래도 있고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부엉새도 울고 나도 울었다”는 옛노래도 있다. 지오디(GOD)의 ‘어머님께’는 극단적인 모성애를 강조하고 있다. 아, ‘엄마를 부탁해’란 제목의 신경숙의 소설도 있다. 심지어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는 아예 남성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는 희생, 고난, 사랑, 인내 등등 추상적인 언어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면서도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외치지 않았던가. 그뿐인가. 한동안 어머니날만 있었지, 아버지날은 아예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도 가정을 꾸리면서 어머니 못지않게 고난의 세월을 겪지 않을까. 아버지는 억울하다. 내일은 어버이날. 스스로를 희생하며 지구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에게 이 글을 바친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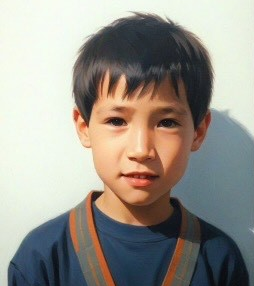
![[서평은 아닙니다만] 살아남는 스토리는 무엇이 다른가](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story-00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