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마약류 감정 건수가 7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확산하면서 압수품 감정이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청년층의 합성대마 전자 담배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마약류 유형 변화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학적 대응을 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마약류 감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마약감정 통계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신종 마약류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해외직구와 국제우편 등 비대면 유통 경로가 확대되면서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마약류 감정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연간 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약 4만3000건에서 2024년 약 12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국과수는 2019년 버닝썬 사태와 2022년부터 이어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으로 감정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과수에 접수된 감정물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감정 건수 중 소변과 모발 의뢰 비중은 2018년 71%에서 2024년 55%로 줄었다. 반면 분말·주사기·전자담배 카트리지 등 압수품의 감정의뢰 비중은 2018년 29%에서 2024년 45%로 증가했다.
이는 마약류 단속의 초점이 단순 투약자 적발에서 공급·유통망 차단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압수품의 감정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감정에서 소변·모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주로 압수품 형태로 유통·적발되는 신종마약류와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가 확산하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감정량의 50% 이상을 담당해 마약류 유행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품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 미만이던 신종 마약류의 비율은 2024년도 35%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통 마약류에는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마(마리화나) 등이 속한다.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의 법적 규제를 피하려고 화학구조를 바꿔가며 새롭게 합성한 것으로 합성대마, 신종 케타민, 펜타닐 등이 있다.
지난해 국내 마약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합성대마와 반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확산이 뚜렷하다. 합성대마류 검출 건수는 2023년 3516건에서 2024년 5650건으로, 델타8-THC 등 반합성대마 검출 건수도 같은 기간 318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10대·청년층의 합성대마 전자담배 남용 심각
외관상 마약류로 인지하기 어려운 전자담배 형태의 유통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해 흡연하는 방식이다. 합성대마류 압수 건수는 2022년 2220건에서 지난해 5650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 중 전자담배(1262건)·액상형(2606건)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전자담배·액상형 비율은 2022년에는 61.0%였다.
특히 청소년·청년층의 합성대마 전자담배 남용이 심각하다. 전체 대비 비율(3.1%)은 작지만 10대의 합성대마류 압수 건수 176건 중 138건(78.4%)이 전자담배와 액상형이다. 20대는 이 비율이 71.5%였다.
최근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10대에게 유통·흡입시키는 범죄도 적발되는 상황이다. 국과수는 마약 접근성과 중복 투약 경향이 높아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기존에는 드물었던 코카인, 합성아편류(플루오로펜타닐 등)와 같은 고위험 약물의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의료용 마취제의 오·남용 역시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국과수는 분석했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 후 운전, 항공기 내 난동, 강력범죄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www.nfs.go.kr) 내 ‘홍보관→간행물’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백서는 급변하는 마약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21대 대선 앞두고 딥페이크 범죄 우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1/news-p.v1.20250521.ddc4a5646cce4cfdb6802689fe7a5230_P1.jpg)
![[MPIS 2025] 의료기관 개인정보 유출, “다크웹 유통 현실화…보안 패러다임 전환 시급”](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5/166375_194979_577.jpg)

![[Health&] [기고] AI는 치료를 돕는 도구…진료 중심은 여전히 환자여야 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6/6a69d8f3-a1c7-4624-80a9-e7f6a38b1f7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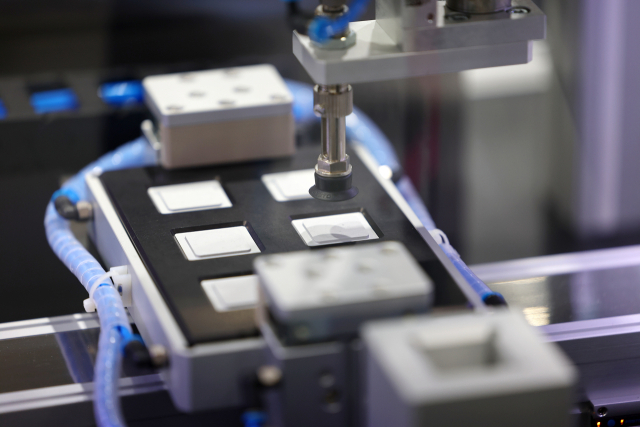



![[MPIS 2025] "의료기관의 신뢰, 네트워크 보안에서 시작"…안랩, MPIS 2025서 제로트러스트 기반 전략 제시(영상)](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5/166374_194977_43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