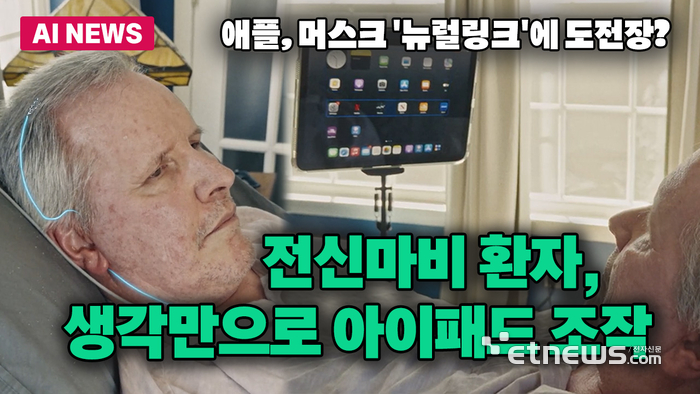요즘은 어디를 가나 자동문이 있다. 현대적 감각으로는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앞으로 다가가면 문이 스르륵 저절로 열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처음 그것을 접했을 때 마치 요술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새로이 신기하게 느껴 보자. 독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자동문을 통해 드나드시면서 그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셨는가.
코네티컷주의 자동문
‘열려라, 참깨’식의 막연한 상상들은 옛날부터 했지만 실용적인 자동문의 발명은 20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1931년도에 미국의 공학자 레이몬드와 로비가 해낸 일이었고 그것을 처음으로 설치한 곳은 코네티컷주에 있는 한 식당이었다. 웨이터들이 요리나 음료를 잔뜩 운반하면서 힘겹게 문을 열지 않아도 되도록 고안한 것이었다.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기계적 설비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앞에 온 것을 알고 그 장치를 작동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센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문 앞에 다가선 사람의 체중을 감지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신기한 자동문
광전 효과를 응용한 발명품
아인슈타인이 원리 밝혀내
상대성이론보다 더 인정받아

레이몬드와 로비의 자동문 장치는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에 기반한 것으로, 이는 그 당시로서는 첨단 물리학 지식을 응용한 것이었다. 광전효과는 금속 표면에 빛을 비쳤을 때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신기한 현상이다. 빛을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광선이 문 앞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다가와서 그 빛을 막을 때 전류의 흐름이 끊기고 그 전류의 변화를 신호로 하여 문을 여는 기계적 장치의 작동을 명령하는 것이다. 광전효과는 1887년에 독일의 젊은 물리학자 헤르츠가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그가 전자기파를 만들어 내는 연구를 하던 중에 얻은 부산물이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자기 채널이 몇몇 (메가)헤르츠라 하는 전파의 주파수 단위는 그의 공헌을 기리는 뜻에서 명명된 것이다.
헤르츠의 발견 이후 광전효과의 현상은 자세히 연구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광전효과를 처음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해 낸 이는 다름아닌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불과 26세였던 1905년에 광전효과를 멋지게 다룬 논문을 출간했다. 그 당시 대학교수 자리도 잡지 못하고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내놓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바로 그 시기에 광전효과 연구도 하였던 것이다.
패기만만한 무명의 젊은이 아인슈타인은 플랑크가 흑체복사(黑體輻射·black body radiation)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놓았던 양자 개념을 광전효과에 응용하였다. 그때 광자(photon)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그때까지는 빛이란 전자기파의 일종, 즉 가상적 물질 에테르 안에서 일어나는 파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의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빛의 입자인 광자의 하나하나가 그 빛의 주파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다고 가정했으며, 그러한 가정에 바탕해서 그때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광전효과의 특성을 설명해 내었다.
양자역학의 기본적 원리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광전효과에 의해 금속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금속 표면에 비치는 빛의 색깔에 따라 결정되지,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는 상관이 없다는 관측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광전효과는 광자와 전자가 1대1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하나의 광자가 얼마나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만큼을 하나의 전자에 전달해 준다. 광자의 에너지는 주파수와 비례하며, 빛의 색깔은 주파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색깔과 에너지가 직접 연관이 있다. 그 반면 빛의 강도는 광자의 갯수에 기반한 것이고, 아무리 많은 광자가 쏟아진다고 해도 전자는 광자 하나밖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추론하면서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격을 겸비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파동-입자 이중성 개념은 결국 양자역학의 기본적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1921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광전효과에 관한 업적이 특기되었고, 그 반면 상대성이론은 유명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걸 돌이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벨상위원회가 무지했다고 비난들을 한다. 상대성이론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 자체를 흔들어 놓은 혁명적 사건이었고, 광전효과는 별로 깊은 뜻이 없는 일개 현상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일리는 있는 비판인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것도 짧은 생각이다. 광전효과는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도 실용적으로 응용하기도 쉬운 현상이었지만, 그런 일상적 현상을 다루는 과학이 소위 심오한 원리를 다루는 과학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이유는 없다. 또 광전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 난제였으며, 아인슈타인이 내려준 해법은 양자역학의 발달 초기에 큰 이론적 공헌을 해 준 것이었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간단히 대답하기는 힘들다. 자연의 모든 측면에 오묘한 이치가 숨어 있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단순한 장치에도 깊은 이론적 원리가 배어 있으며, 자연 현상과 인간의 발명품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MZ세대가 주도하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혁신: AI 전자문서 플랫폼의 미래](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1/news-p.v1.20250811.bfe0838c6833424199cf396c892f34e4_P3.jpg)

![[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39〉챗GPT가 생각을 가진다면](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8/news-p.v1.20250808.21e693fa5cfb4775b2701d080b487bde_P1.jpg)
![[로터리] ‘디지털 불멸’의 빛과 그림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3FWOUH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