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GLP-1 계열로 급성장한 뒤, 제약업계의 경쟁 초점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GIP·GCGR 등을 아우르는 이중·삼중 작용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GLP-1이 시장을 열었다면 차세대 약물은 투여 편의성과 체중 감량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그로쓰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차세대 기전 중에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이중·삼중 작용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장기 지속형은 주사 횟수를 줄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다중 기전 약물은 GLP-1 단일 기전에서 한계가 드러난 체중 감량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하나의 기전만 겨냥했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사 경로를 동시에 공략하는 방식이 주류로 부상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책 불확실성과 관세 리스크가 비만약 업종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환율과 통상 이슈에도 민감해 국가별 규제 변화와 무역 갈등이 업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수출(아웃라이선싱)이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사업 기반을 다진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부 기업이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파트너와 공동 개발하거나 조기 기술이전을 통해 임상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와 손잡아 개발 리스크를 분산하고 조기 현금 유입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신약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간 소요되는 임상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재무적 체력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투자 관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 효율성과 해외 협력 여부가 앞으로 비만 치료제 분야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수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상업화 가능성이 기업 가치를 좌우할 것이란 의미다.
GLP-1 계열 약물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을 키웠다면 앞으로는 장기 지속형 제형과 다중 타깃 기전이 새로운 무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차세대 치료제 경쟁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은 결국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수출 역량”이라고 말했다.
![[Health&] 완치 어려운 소세포폐암, 신약 유지요법으로 생존율 끌어올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5/67eb5c83-f64e-47a4-8f1b-c230d7a3f63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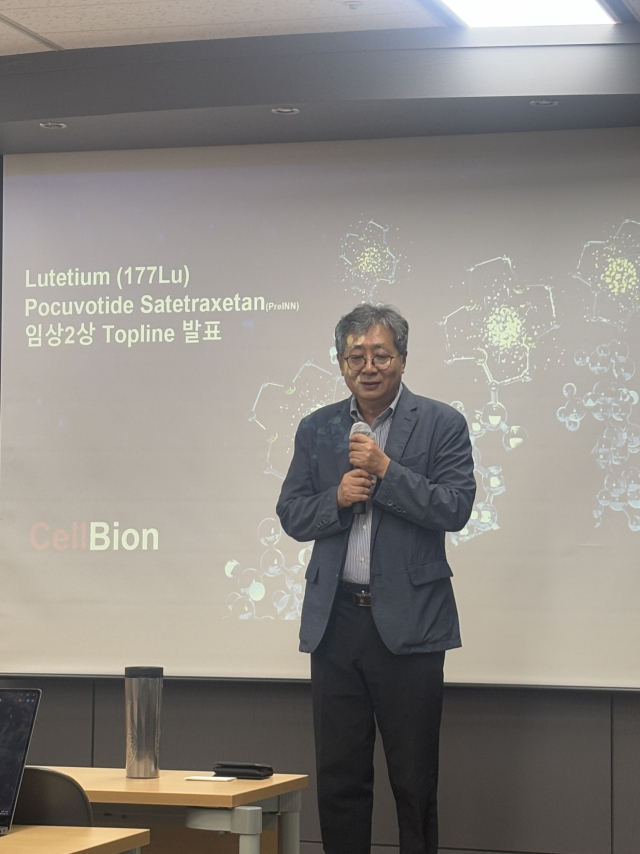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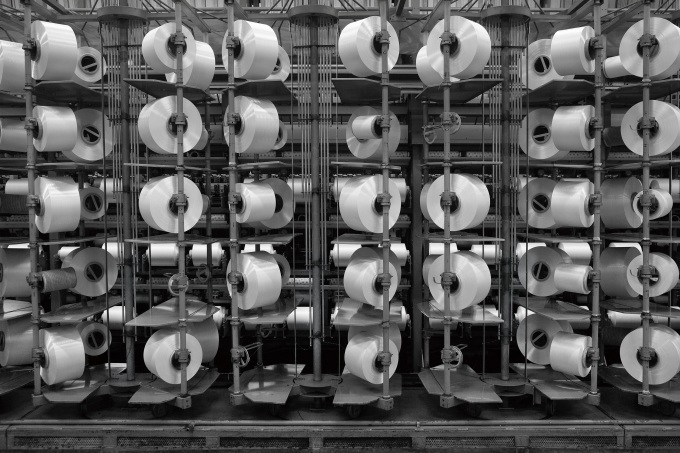
!['이가탄'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S2W 코스닥 입성 [이번주 증시 캘린더]](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TSUOET_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