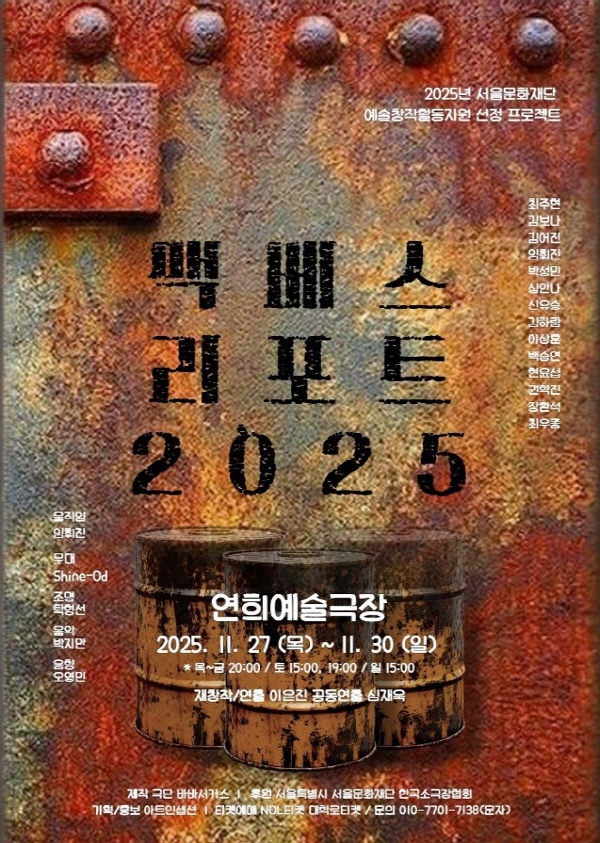‘다이내믹 코리안’이라는 용어가 세계인의 뇌리에 새겨진 건 2002년 한일월드컵 즈음이었다. 한일월드컵은 4강 신화의 금자탑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가장 요란하고도 질서정연한 사람으로 여기게끔 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필자에게 이 사건은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국인은 수줍고 슬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그 유명한 표현이 가리키듯이 말이다.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에선 분란이 끊이질 않았는데, 상당수는 외침(外侵)의 성격을 가졌다. 병자호란, 청일전쟁, 일제강점, 6·25…. 한국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고난의 당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한 상처와 슬픔이 깊었다. 그래서 생겨난 일반적인 감정이 ‘설움’이었다.
고난에 설움 겹쳐 형성된 한의 문화
기꺼이 고난 감수하는 한류로 발전
역동적인 사람들로 한국인 재탄생
옛 문화의 실질은 계승 발전시켜야
설움이란 아픔과 억울함이 겹쳐진 감정이다. 즉 내 인생이 고달픈데,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생겨난 감정이다. 설움은 감정을 격화시킨다. 화병이 도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문화가 개발되었다. 한(恨)의 문화가 그것이다. 천이두 교수가 공들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한의 구조 연구』) 한의 문화는 거친 풀들을 모아 한약을 달이듯 설움을 오래 다스려서 맑게 정화된 감정을 만드는 한국인 고유의 예술치유법이다. 그 정수에 해당하는 게 고려청자·조선백자라는 것이다. 아마도 조용필의 노래 ‘한오백년’이 한의 문화를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21세기 초엽에 한국인은 돌연 역동적인 사람들로 재탄생하였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한류의 세계 장악으로 확실한 것이 되었다. 비, 싸이에서 시작해 BTS에서 절정에 달하고, 블랙핑크로 퍼져 나간 한국 댄스음악은 날렵하고도 짜릿하고도 충만한 율동을 폭발시키며 세계인의 눈을 빨아들였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필자는 하나의 단서를 찾아내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감자이자 의사로 살았던 빅터프랭클(Viktor Frankl)의 수감자들 행태 분석이었다. 애초에 수감자들을 견디게 해주는 건 “내일은 풀려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때문에 낙심은 점점 커졌고 마음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희망을 버리자 절망 자체를 살아내는 방법론들이 고안되기 시작했다. 나치가 만든 지옥 속에서 꿋꿋이 버틴 사람들은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었다.
한국의 댄스 음악은 어린 세대들을 통해서 출현하였다. ‘어린 세대’란 옛날의 고난에 미련을 가지지 않은 세대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가혹한 훈련을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세계 대중문화를 최고도로 세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열악한 현실을 그 자체로 신생을 위한 에너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옛날의 한의 문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의 밑바닥에서 재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의 문화가 ‘고난 더하기 설움’이라면, 한류는 ‘고난 빼기 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한류 역동성의 기원이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태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산업 역군들,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독일로 떠났던 간호사들이 만든 생활의 방식들이 오늘날 역동적인 한국인들을 만든 바탕이었다. 다만 옛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이었으나, 오늘의 청년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연단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공동체는 ‘나’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들의 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바뀐다.
최근 필자는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에서 한국뇌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읽었다. 수컷 금화조가 아침에 노래하는 까닭이었다. 그들은 암컷이 없어도 새벽 합창을 한다. 이는 짝짓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에 대한 반동이다. 즉 어둠은 노래를 억제하지만 그 억제는 동기를 강화하고, 새벽빛과 더불어 억제가 풀리며 합창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이 또한 상황 자체를 생의 전력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신생 한국인들을 만든 새벽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민주화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민주화의 개시 이후, 한국인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를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1987년부터 200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인의 체질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진화적 특이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다만 이 와중에 옛 문화는 새 문화를 위한 에너지로 몽땅 전화되어서, 문화의 실질이 사라지는 위험에 처한 것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옛 문화의 찰지고 고운 요소들을 간추려 새 문화로 빚어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에너지는 소비되지만 실질은 축적되는 것이니, 거기에 한국문화가 세계문화에 기여할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과리 문학평론가·연세대 명예교수
![[K컬처 리포트] '응답하라 1988'은 K콘텐츠의 '오래된 미래'](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769-74890-sample.jpg)
![[ET대학포럼] 〈247〉명곡은 세대를 넘고, 과학은 세대를 잇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8/news-p.v1.20251118.129116edb69a487aaad6e342155030ce_P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