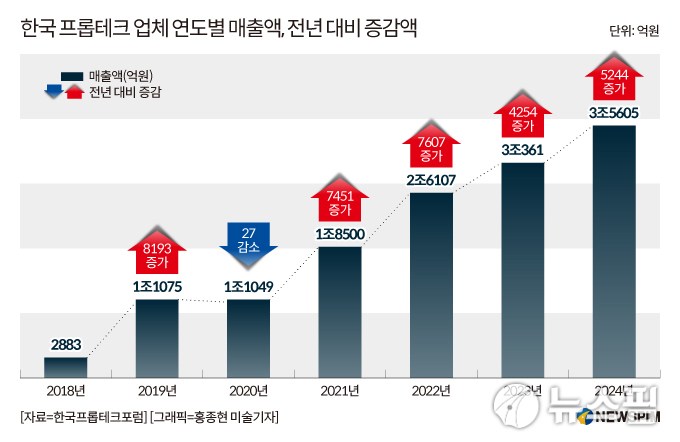‘혁신 후진국의 민낯’ 드러낸 한은 보고서
미·중은 로보택시 자리잡는데 우린 뭐하나
“사회 기풍을 혁신 수용적으로 확 바꿔야”
차량이 길게 늘어선 차선 중간에 끼어들기. 새치기당한 뒤쪽 운전자가 싫어하는 ‘얌체운전’이다. 옆 차선의 차량 흐름을 읽으면서 이걸 척척 해내는 택시엔 운전자가 없었다. 중앙일보가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현지 르포로 소개한 바이두의 6세대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 ‘RT6’ 얘기다. 인구 1300만 명의 자유주행 중심도시 우한의 요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본지 7월22일자 1, 4, 5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에는 혁신 후진국 한국의 민낯이 생생하게 담겼다. 미국은 웨이모(구글)와 테슬라, 중국은 바이두를 앞세워 도심지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상용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은 테스트조차 못한다.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4년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하고 미국·중국의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10년 내 25~50%에 이른다고 한다. 한은 보고서는 “이대로라면 국가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결국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사회가 혁신을 대하는 자세는 ‘타다’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에 새 규제를 추가하며 우버·타다 같은 신산업 출현을 막아왔다. 전통 택시산업 보호에만 초점을 두니 기술 발전이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런던·싱가포르 등의 택시시장에서 우버·그랩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비중이 85% 이상이고 전통택시 비중은 12~14%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 택시시장은 전통택시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은 무시하고 혁신의 장벽을 높이 세운 탓이다.
자율주행택시는 인건비가 거의 안 들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이 기존 택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무리 보호벽을 쳐도 기존 택시는 버텨내기 힘들다. 현재 자율주행택시는 웨이모·테슬라 등 택시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 중이다. 초기 투자비용, 사고시 보험 책임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 택시는 사업이 쉽지 않다. 한은은 “그간 정체된 산업구조와 높은 개인택시 비중을 감안하면 준비 없이 자율주행택시 시대를 맞이할 경우 기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보고서는 혁신의 당위론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기금 조성을 통한 개인택시 면허 매입 등은 시도해볼 만하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성공사례를 만든 뒤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도 현실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쓴소리를 해왔다. 2023년엔 “10년 넘게 중국 특수(特需)에 취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가야 할 시간을 놓쳤다”고 했고 지난해엔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2월엔 “정부가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창조적 파괴에 수반되는 고통을 외면하니 맨날 제자리걸음이다.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윤희숙은 최근 신간에서 “사회 기풍을 혁신 수용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외면하면 그의 표현처럼 “대한민국, 곱게 늙는 게 최선”이라는 비관론만 남는다.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 성장도 혁신과 구조개혁 없이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격(緣木求魚)일 뿐이다.
![공기업도 세계 1등이 되자[로터리]](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TLPHV0_1.jpg)

![[GAM]BMW '슈퍼브레인' 전기차 ② '새로운 벤치마크' 낙관론](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Biz-inside,China] R&D∙스마트 생산기지...中 외자기업, 정책 호재 타고 대중 투자 확대 '잰걸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4/84b94522-0a9b-4822-add7-b2d66a1f11f1.jpg)

![[데스크라인]TV, 영원한 1등은 없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4/news-p.v1.20250904.7cc939fb49914d718f70fb3317168c41_P1.png)
!["해외주식 보관액 첫 200조 넘었다" 서학개미, 국장 탈출 심화…SK온, 中 저가공세 뚫고 2조 규모 ESS 수주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82IIXD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