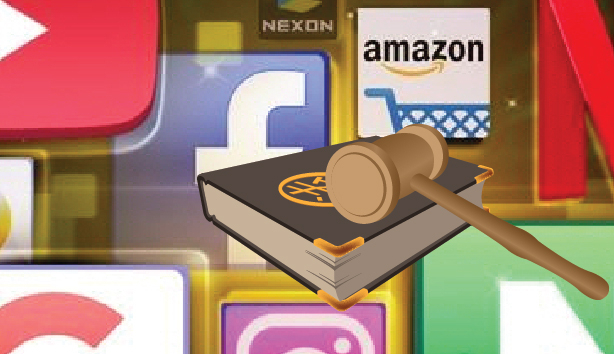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 2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럽과 한국 등이 우리 기업을 차별하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탄생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겠다는 선전포고로 해석됐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공룡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제정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의 핵심은 사전지정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빅테크 플랫폼을 독과점 사업자로 미리 정해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에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법은 국내 빅테크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에 막혀 지난해 2월 연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미정산 사태를 겪고 두 달 뒤 반칙 행위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가 빠져 유럽연합(EU)·일본·영국의 유사 법률에 비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한 법안이 6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은 지난해 9월에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플랫폼법은 사전지정제가 빠진 데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을 유럽과 동일 선상에 놓고 압박에 나선 것은 의아한 일이다. 여하튼 미국에 순응하자니 빅테크 플랫폼의 전횡이 심해질까 우려되고 EU 등을 따르자니 미국의 보복이 두려운 딜레마에 처했다. 날로 복잡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걸맞게 플랫폼법도 유연한 모습으로 진화해야 하겠다.



![국회 입법조사처 "통신사 재량으로 위약금 면제 가능" [디지털포스트 모닝픽]](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5/54251_147883_549.jpeg)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대중 관세, 선제 철회 없다" 外](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1021304130.jpg)

![[종합] 미 상무부 "바이든 AI 칩 규제 시행 철회…간단한 규정으로 대체"](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0545581850_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