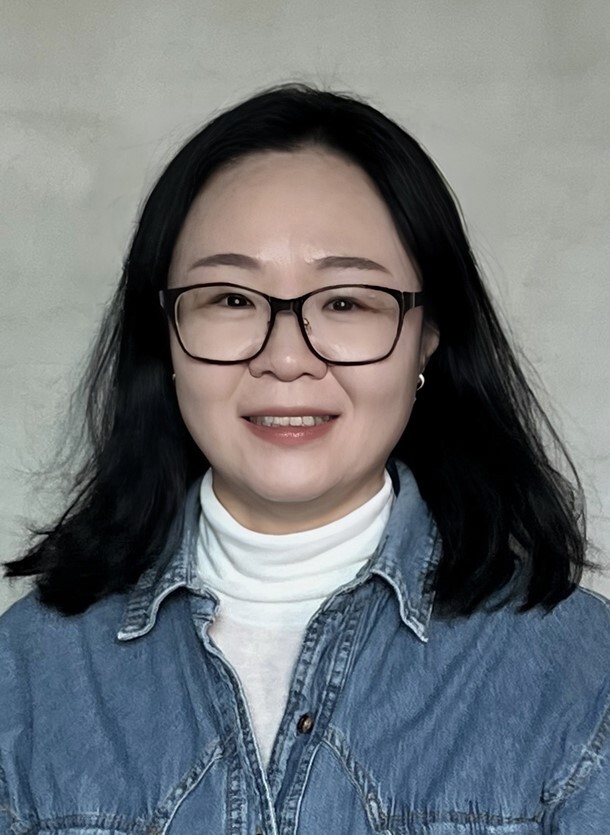
“장르나 학력이 예술의 본질을 규정하는가?”, “미대를 나오지 않아도 미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공론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주제의 콘텐츠를 영향력있는 유투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흔히 미술씬, 아트씬이라 말하는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예술업 종사자들의 전공여부, 학위, 유학파나 비유학파 등에 대한 논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예술 분야에서 기획을 하는 기획자 역시도 자연스레 이런 논쟁의 곁에 가까이 있게 된다. 예술계 위계와 경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기획 프로젝트의 과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하고 오래된 질문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전 기고문에서 언급했다시피 지역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와 기획 전시, 아트페스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예술가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시각예술분야, 공연예술분야의 현업 예술가들과 소통하다보면, 사회 곳곳에서 경험하는 선긋기과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왕왕 듣게된다. 미술 작가가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인정받으며 작품도 팔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최근까지도 작가의 ‘출신 논란’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소위 예술업을 하는 사람의 조건을 규정하는 데에는 지금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재를 바꾸어, 미술 작가들과 함께 하는 미술 프로젝트 구성과정을 잠깐 언급해보고자 한다. 기획자가 하나의 미술 전시나 프로젝트를 만들 때 기획 방향에 적합한 작가 구성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작가 선정 시 작가의 활동 경력, 장르, 작품성 등을 두루 살피게 된다. 이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지만, 단연 우선이 되는 것은 ‘작가로서 행위, 흔적들이 얼마나 작품활동에 집중되어 있는가’이다. 여기서 ‘집중’은 작품을 하는 데 쏟은 시간과 노력, 실험정신 등 작가가 자신의 일(미술)을 대하는 몰입적 태도이다. ‘성실함’으로도 표현되는 이것은 작가로서 행하는 삶 자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작가가 아닌 사람과 구분지을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마찬가지로 작가를 서포트하고 성장시키는 업계 관계자들 역시 늘 예술의 경계에 잘 있는지를 평가받고 선택 받는다. 예술을 하기 전은 ‘예술계 외부인’이었을지 몰라도,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작가로 활동하거나 기획자, 사업가가 된 사람들은 그 분야에 오롯히 집중하는 예술노동자들이다. 즉 업의 본질은 예술이라는 것에 얼마나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 사회적 불편함을 감내하고라도 각자의 언어로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에 있다.
요즘 예술계에서는 국내외 혁신을 말하며 경계의 확장, 예술과 타 분야간의 융합을 시도하느라 분주하다. 확장과 융합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규정된 선을 넘어서거나 층위을 넘나들게 된다. 새롭고 이질적인 것을 일정 속성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확장과 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술계가 시대적 전환을 원한다면 현존하는 시스템의 일부나 전부를 변화시키고 실험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을 경계와 위계에 가두려는 행위가 현장으로 이어진다면 다시금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이 시대의 ‘예술가’란 어떤 사람인가?, ‘예술 노동’의 역할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다. 예술계에서 바라 마지않는 다양성 존중과 공존으로의 의식 전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김현정 디자인에보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술업에 대한 경계와 위계 논쟁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이재명 "저 사시 붙었어요"…부친의 눈물, 그게 임종이었다 [대선주자 탐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6/dc518365-6494-427d-b446-7e5c2732d0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