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도전은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이라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산업과 지역별 격차가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어 인구정책과 노동정책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장년층의 지방 이동이 노동력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14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 발표한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2022~2042년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 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철희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 정책과 노동 정책의 밑그림 설계에 기여해 온 전문가로 이번 연구 결과는 실제 정책 현실화 가능성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없는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 시군구’가 2042년에는 15개로 늘어나고, 반대로 ‘30만 명 초과 시군구’는 18개에서 2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격차 확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상위 10%와 하위 10% 시군구의 경제활동인구 규모를 비교한 P90/P10 비율은 같은 기간 13.4배에서 26.4배로 두 배 가까이 커지며 지니계수도 0.492에서 0.560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태어난 아동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걸려 단기간 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청년층(20~34세)의 대도시 집중 완화는 지역 불균형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청년 인구 유출이 멈출 경우 2042년 P90/P10 비율은 26.4에서 24.9로 줄었고 지니계수도 0.560에서 0.557로 완만하게 낮아졌다.
보고서는 또 장년층(50~64세)의 수도권에서 지방 이동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장년 인구 이동이 사라질 경우 오히려 불균형이 악화돼 2042년 P90/P10 비율도 확대되고 지니계수 역시 0.56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년층의 도농 이동이 중단되면 중소 시군구의 노동력 감소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청년 인구 이동 편차 완화 △장년층 지방 이전 유도 등을 제시했다. 한은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 정책보다는 지역별 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장년 이동 패턴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향후 지역 노동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사설] 韓경제 22년만에 대만에 재역전…'기업 주도 성장'이 정답](https://newsimg.sedaily.com/2025/09/15/2GXWRX2ZGH_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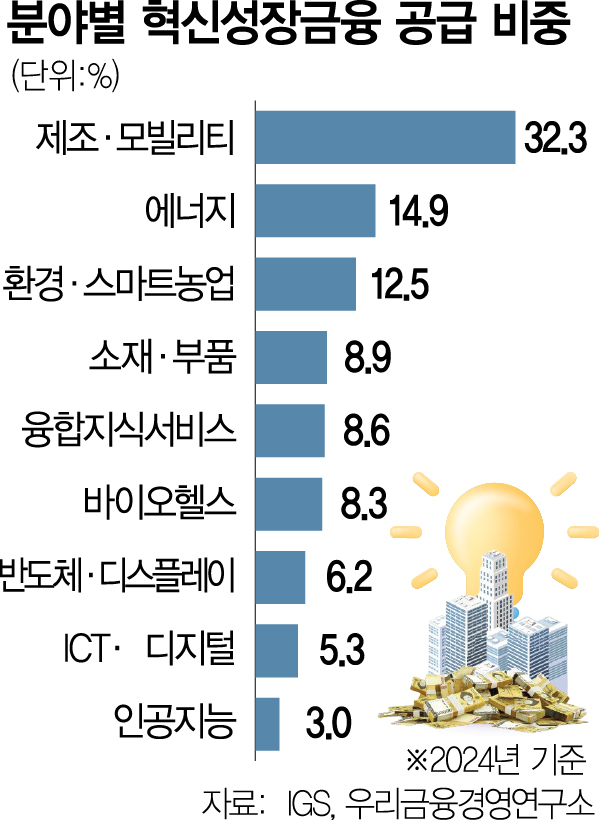


![[오목대] 국가예산과 피지컬 AI](https://cdn.jjan.kr/data2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