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후보별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경제·금융에 대한 정교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다음 정부에서 은행·금융산업은 추락한 경제성장을 혁신성장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혁신금융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혁신금융을 적극 추구해야 한다. 혁신금융 없이 혁신성장은 없다. 0%대로 추락한 성장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플랜이 필요하다.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혁신성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혁신성장은 마땅히 글로벌 유니콘과 데카콘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방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정교하게 위험을 인수하는 혁신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금융은 고위험고수익을 낳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R&D)에 대해 장기에 걸쳐 지원하는 금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벤처자금시장은 공적자금 중심이고 규모가 작다. 그만큼 혁신금융을 위한 시장기반이 약하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은행 역할이 중요하다.
은행은 벤처스타트업 기업과의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혁신금융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 전문성을 사실상 흡수한 HSBC 혁신금융(innovation banking)이다. 우리나라 은행과 금융그룹도 상업은행 한계를 넘어 스타트업 기술R&D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고용하고 벤처조합 출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혁신금융센터를 도입해 혁신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또 400조원을 훌쩍 넘긴 퇴직연금도 영국 맨션하우스협약(MHC 2023)처럼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중개기능을 고도화하고 금융수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2023년 금융서비스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비중 자체는 7% 정도로 영국의 9%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금융국제화 지표인 금융서비스 수지 흑자규모는 2023년 불과 10.95억달러로 영국의 966.1억달러에 크게 뒤진다. GDP 대비 해외 금융자산 보유규모는 2023년 기준 0.79에 불과하며, 일본의 1.70, 영국의 4.29에 비해 너무 낮다. 2000년 이후 GDP 대비 수출입규모는 OECD 평균을 거의 50% 넘어서나 GDP 대비 대외자산부채규모는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실물경제 성과를 발판으로 금융수출을 한 대표적인 예는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그리고 21세기 일본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해외부문으로부터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서지 못하는 반면, 일본은행은 벌써 60%에 근접한다. 글로벌자산운용은 국부창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셋째, 은행·금융업은 효율적인 자금배분뿐 아니라 이자, 자본이득, 배당을 통해 금융소득을 창출하고 분배한다. 은행이 대출 후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험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아 부도위험이 발생하면 예금의 대가인 이자뿐 아니라 예금자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주식발행자인 기업이 기업가치보다 상속세에 더 신경을 쓰면 투자자가 들고 있는 주식은 자본이득의 알을 낳는 오리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투자자의 비용으로 대주주가 편익을 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위험에 대한 정보생산과 관리능력을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주식발행자인 기업은 기업가치의 제고와 투자자의 자본이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융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 현재의 저축은 미래 소비를 보장한다.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은퇴 후 근로소득을 대신할 금융소득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소득창출과 분배 채널에 이상이 생기면 금융소득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뿐 아니라 주식투자에 대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jbkim@kif.re.kr
![[ANDA 칼럼] 더 이상 '두뇌와 자본의 유출 방치' 안 된다](https://img.newspim.com/news/2021/02/04/2102041348556800.jpg)
![골드만삭스 "한국 증시 상승 시작…대선 계기로 '밸류업' 집중"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5/27/2GSYLWQ8G7_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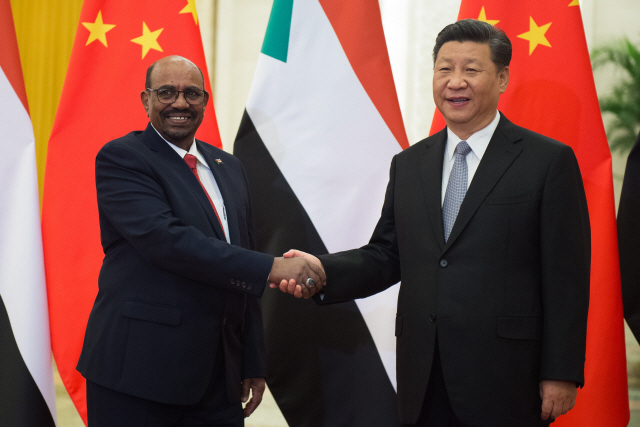

![[기고]인공지능에 관한 대선 공약](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7/news-p.v1.20250527.d94f7fbbf09847cab18cb0a3b8810932_P1.jpg)
![‘트럼프 관세’ 역풍에 금·은 가격차 '100배'…"5년내 칩 기술독립" 中, 첨단산업 두뇌부터 팔다리까지 '자립'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5/28/2GSZ1P2Z8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