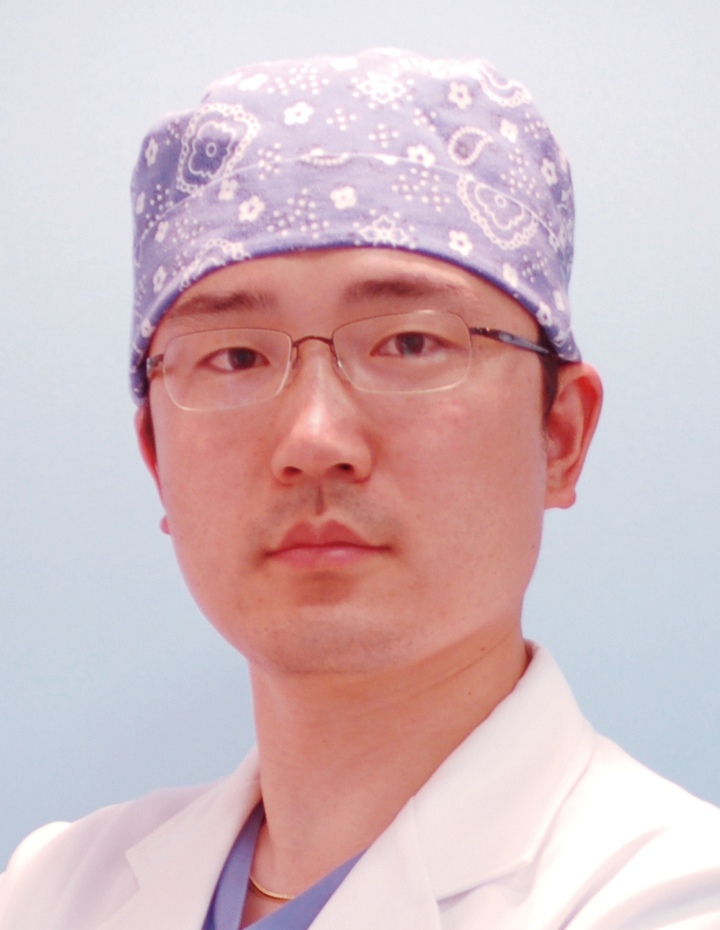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
현대와 같은 고도의 분업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아니 잠이 든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교류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간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만나는 사람의 수와 종류는 더욱더 줄어든다.
40대 치과의사로서 나는 매일 루틴한 생활을 보내면서, 거의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내가 접하고 느끼는 세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누구나 그렇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의 세상의 제한성은 더 커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세상에 대한 관용성도 매우 줄어든다.
의정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인이 아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다. 내 생각에는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들의 세상에서 본 의사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었던 것이다. 친구면서 의료인인 나와 소통하면서도 제한된 세상에서 오는 배타적인 사고는 지나치게 굳건했다.
임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한다. 임상에서 각자의 세상의 차이는 표본 선택 편향과도 유사하다.
양악수술을 주로 하는 나에게 상담을 오는 환자들은 양악수술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오는 사람들이다. 지나가다가 우리 병원이 보여서 들어 온 환자가 아니라.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면 수술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종종 요즘 환자들은 전신마취 수술을 예전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교정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어서, 교정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전신마취 수술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은 수술을 할 생각이 있는 환자는 수술병원을 먼저 상담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교정과에서 볼 때는 요즘 환자들은 예전보다 수술을 더 싫어하는 거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본 설정과 연구 모델을 잘 해야 한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수술을 싫어하기는 하더라도, 교정이 끝난 환자를 오랜만에 체크했는데 이미 양악수술을 받고 예뻐져서 온다는지, 수술과 교정의 borderline case에 있는 환자가 상의 후 비수술교정으로 결정하여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악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다.
제한된 사회 생활에서 오는 오류를 수정하는 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나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협진을 요하는 어떤 환자가 있으면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른 과와 상의를 한다. 그런데 직접적인 케이스에 대한 상의가 아니더라도, 요즘의 추세, 동향,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만나서 교류함으로써 나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고, 다른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관용적일 수 있다.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전공과들이 모인 융합학회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회 모임도 추천된다.
덧말. 그런 의미에서 치과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의 융합학회인 대한양악수술학회에서 9월 27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추계학술집담회를 진행하오니 참여하셔서 나의 세상과 임상을 넓힐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KYD 이슈터미네이터] ①'초고령사회 진입' 한국 주치의 제도, 어디까지 와 있나?](https://img.newspim.com/news/2025/09/09/2509091105198730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