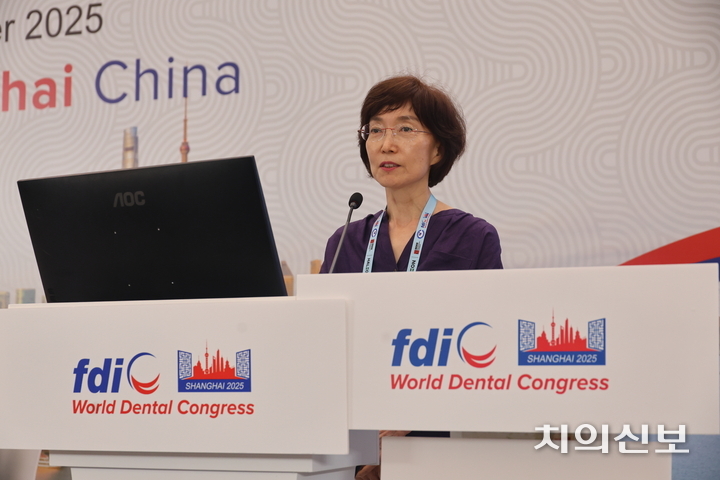‘반상 위의 예술’로 불리는 바둑이지만, 간혹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 더 심한 경우는 승부에 영향을 줄, ‘반칙’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다.
그동안 바둑은 심판이 필요없는 예도의 스포츠로 불리며 심판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저 대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입회인이 1명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입회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돌발 상황을 정리할 ‘억지력’은 없었다. 이에 보다 더 확실한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 바둑은 3년 전부터 상임심판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바둑에 심판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한국은 자국이 개최하는 기전에서는 무조건 심판이 대국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3일부터 8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2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및 제3회 농심백산수배 세계바둑시니어최강전 심판을 위해 현지에 온 김광식 상임심판위원장은 올해로 심판 경력 2년차이자, 조치훈 9단에게서 바둑을 배운 입단 30년차 7단의 프로기사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심판의 역할에 대해 “지금은 반칙이 나왔을 때 개입해서 판정을 내리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주의나 경고 사항, 또는 선수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기원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 상임심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매년 실기와 면접을 통해 심판을 다시 뽑는데, 기존 심판들 중 30% 정도는 새 얼굴로 바뀐다. 김 위원장은 “1년에 한 번씩 상임심판을 뽑는다. 첫 해는 12명을 뽑았는데 1명씩 줄어 올해는 10명을 뽑았다.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며 “기본적으로는 서류 심사부터 시작을 해 면접과 실기 시험을 통해 뽑는다. 1년에 교육을 한 번 정도 받는데, 기존 룰에 대한 숙지가 기본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칭다오에서 농심신라면배와 백산수배 심판을 맡은 김 위원장의 하루 일과는 이렇다.
우선 오전 7시쯤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뒤 서둘러 준비를 해 선수단과 함께 대국장으로 이동한다. 이동 후에는 대국장에 비치되어 있는 룰북을 보고 주요 사항을 다시 점검한다. 이후 대국 시작 1~2분 전 대국 개시선언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 대국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대국 후에는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데, 만약 대국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국 중인 기사들이 방해가 될까 왔다갔다 할 수도 없다. 그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지켜봐야만 하는데, 그게 보통 힘든게 아니다.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안하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 화장실 가는 것도 신경쓰여 되도록 대국 시작 전엔 되도록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원래 한국의 바둑 심판제는 대국 중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 1월 LG배 결승 2~3국에서 일어난 커제 9단의 ‘사석 논란’으로 인해 그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적극적인 심판’이었다면, 지금은 ‘개입을 최소화하는 심판’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이제는 선수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말했다.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바둑은 심판이 화면에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늘 대국을 원활하게 마무리짓겠다는 마음으로 임한다.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때마다 선수들이 납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심판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