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경력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단기 과제를 여러 개 쪼개 맡아야 했다. 실험보다 보고서가 우선이었고, 협력보다 경쟁으로 흩어졌다. 이것이 PBS(Project-Based System·연구과제 중심제도)가 만든 배경이었다.
1996년 전면 도입된 PBS는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연구자들을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았다. 출연연은 공동의 목표를 잃고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다. PBS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이어져 온 이유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PBS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경로를 새로 쓰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면 연구자들은 생존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기술, 초난제 해결, 원천기술 확보 같은 장기적·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PBS가 도입된 배경에는 출연연의 비효율과 성과 부족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정적 지원에 안주한다면 과거의 병폐가 다른 얼굴로 되살아날 수 있다. 따라서 출연연은 자기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출연연의 경쟁력은 개인 연구자가 아니라 집단적·조직적 연구에서 비롯된다. 대학이 개인 역량의 무대라면, 출연연은 조직적 플레이를 통해서만 국가 혁신 체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물론 내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같은 상위 기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면, 기관장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전략을 마련하고, 연구자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각 출연연의 정체성도 분명해야 한다. 대학이나 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산·학·연을 연결하고 보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존재 이유를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출연연이 단기 경쟁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혁신 체계 속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우수 연구자가 출연연을 선택하고 자율성과 도전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집단의 역량은 커지고 협력은 한층 빛을 발한다. PBS 폐지는 30년간 연구자들을 묶어온 족쇄를 풀어낸 역사적 전환이다. 그러나 족쇄를 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출연연이 인재들에게 꿈을 펼치고 머물고 싶은 일터로 거듭날 때 PBS 폐지는 비로소 진정한 연구 혁신의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권석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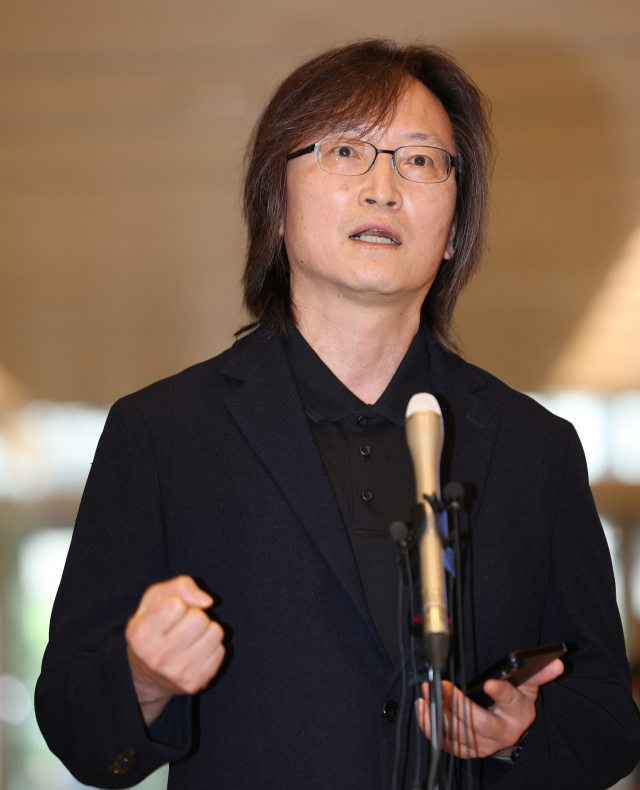
![[바이오헬스 디지털혁신포럼]글로벌 의료AI 경쟁력, 신속 시장 진입·연구 생태계 조성 시급](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5/news-p.v1.20250825.85471eb8f2154ebfa67a2cfe6f420149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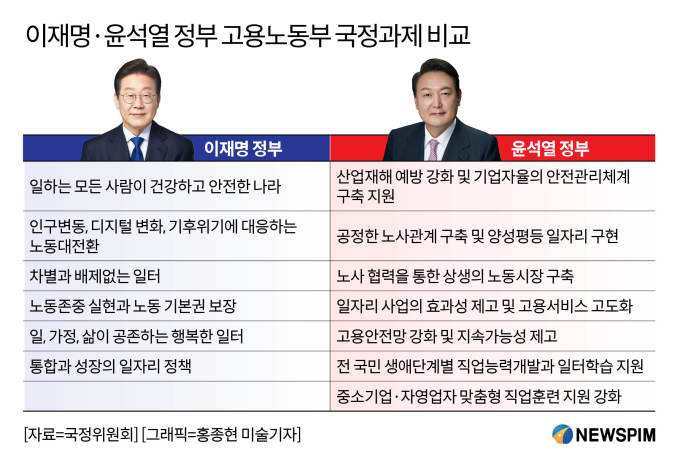
![[세종25시] 예산철 왕좌는 여전히 '기재부'](https://img.newspim.com/news/2025/08/23/2508231849196290.jpg)

![[ET시론] '모두의 AI' 문제는 How to](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5/news-p.v1.20250325.30e43afe3d3940918e75be056bed0bd4_P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