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은 시인(1982년생)
전북 정읍 출신으로 20세인 2002년 '현대시' 통해 등단. 시인은 언어유희(일종의 말장난)를 활용한 시를 많이 쓴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함께 나누기>몽골 지배를 받던 고려 때 매사냥이 성행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냥매를 사육하는 응방(鷹房)이란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당시 궁궐에서 시작된 매사냥은 귀족 사회로까지 번져나가 많은 이들이 매사냥을 즐겼다.
이렇게 매사냥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길들인 사냥매를 도둑맞는 일이 잦아졌는데 매를 훈련하기 힘들다 보니 차라리 훔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로 자기 매의 깃에 특별한 꼬리표를 달아 표시했는데 그것을 ‘시치미’라고 했다. 그걸 몰래 떼와 자기 매에 달고는 자기 것 인양했다.
이처럼 사냥매 깃에 붙은 시치미를 떼 버린 상태인 ‘시치미를 떼다’란 관용어가 현재는 '알고도 모르는 체하다'는 뜻으로 변했다. 이 관용어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 주로 쓰인다.
오늘 시에서도 '언어유희(말장난)'가 잘 드러나 있다. “옛날옛적에 매의 주인이 있었어 / 천연기념물인데 매에도 주인이 있어? 이야기는 중단된다” 시는 친구인 두 사람의 대화 형태로 전개된다. 갑 친구가 옛날에 매에게도 주인이 있었다고 하자, 을 친구가 반론을 제기한다. 매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조류인데 어찌 주인이 있느냐고.
말대로 라면 하늘 나는 매는 주인이 없는데 왜 주인이 있는 것처럼 우기느냐는 말이다. 그러니 둘의 대화가 중단될 수밖에... “너는 꼭 매를 벌어 / 번다는 건 얻는다는 거야? / 이야기의 앞길이 막힌다” 이 시행에도 언어유희가 나온다. 하늘을 나는 ‘매’와 육체적 체벌인 ‘매’를 동일시하여 비트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 ‘매를 벌다’ 할 때 ‘벌다’와 '돈을 벌다'의 '벌다'가 같은 뜻이냐고. 그러니 다시 한번 대화가 막힌다.
“매는 맷과야 / 독수리가 수릿과인 것처럼? / 이야기는 공회전한다” ‘매를 벌다’와 ‘돈을 벌다’에서 '벌다'의 뜻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갑이 내놓은 해명에 을은 수긍하려 들지 않는다. 즉 매는 맷과에 속하고 독수리는 수릿과에 속하니 다르다는 식으로 주장하니 다시 대화가 공회전하고 만다.
“시치미를 떼는 사람 이전에 / 그것을 단 사람이 있었듯” 마지막으로 화자가 나타나 정리를 한다. '시치미 떼다'란 말이 나오기 이전에 '시치미 달다'란 말이 먼저 있었다고... 정말 그렇다. ‘시치미 떼다’란 관용어가 있다면 ‘시치미 달다’란 관용어도 있어야 한다
그럼 시인은 이 시를 어떤 의도로 썼을까?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엔 시치미 다는 사람은 없고 시치미 떼며 사는 사람 뿐이다. 자기가 해 놓고 하지 않았다고 우긴다. 정치인도 법조인도 당연히 시치미 떼며 산다. 마치 그렇게 해야 그 자격에 맞는 듯이. 예전에 검사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를 안정하게 하고, 판사가 되려는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라고 답했다.
지금은 다르게 말하는 세상이 됐다. 검사가 되려 함은 자신이 잘못 저질렀을 때 빠져나가기 위함이요, 판사가 되려 함은 혼자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맛을 보려고...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그들을 잘(?) 본받아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법을 갖고 노는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정말 큰일이다. 시치미 떼는 사람만 지천인 세상에 시치미 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진정 원하는지...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大記者
sgw3131@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작가-김연진 '눈물 파는 아이, 곡비'](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14/.cache/512/2025051458001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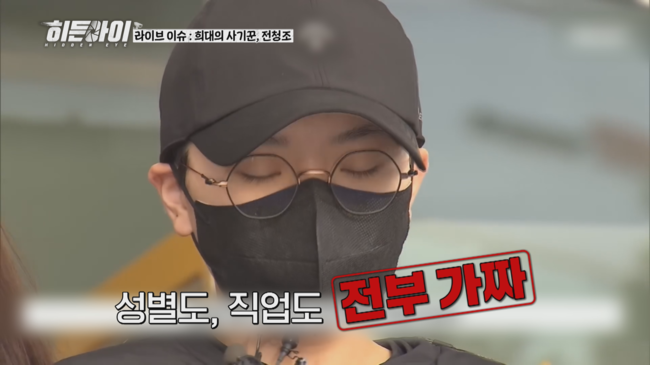
![[김병기 ‘필향만리’] 不逆詐 不億不信(불역사 불억불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9e295845-1b14-4f1c-81eb-55a62171578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