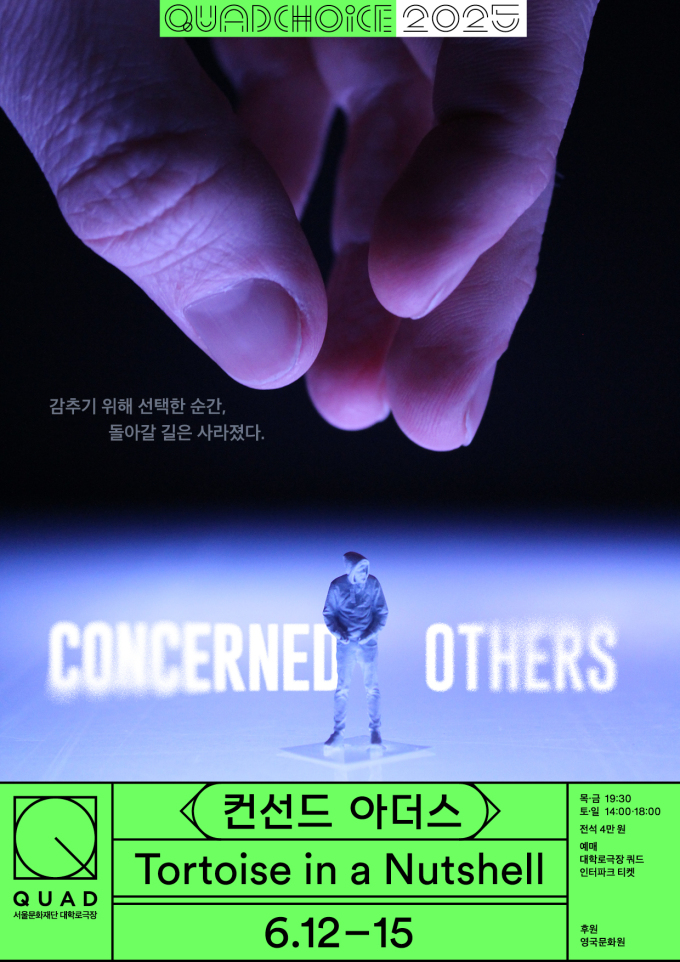‘헤다 가블러’로 연극계가 뜨겁다. 국립극단과 LG아트센터라는 대형 제작사가 같은 작품을 동시에 공연하고 있어서다. 비교당한다는 스트레스로 만드는 사람은 예민하겠지만 관객들은 서로 다른 ‘헤다’를 비교하면서, 희곡의 연극적 변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작품을 쓴 헨리크 입센은 근대극의 서막을 연 극작가이면서 사회와 불화하는 문제적 여주인공을 여럿 남겼다. 남편의 인형이 되기 싫다고 집을 나간 노라(‘인형의 집’)나 가부장 체제에 순응하다 파멸하는 알빙 부인(‘유령’)은 이제 일반 관객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반면 그의 후기작인 ‘헤다 가블러’는 작품 초연 이후 한 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여성을 다룬다. ‘헤다’는 아름답지만 파괴적이고 늘 세상이 불만족스럽다. 솔직하지만 오만하고 죄의식 없이 타인을 파괴하며 심지어 자신마저 파괴하는 타나토스적 인물이다.
전통적인 여성상에 묶여있거나 이를 넘어서고자 계몽적 의식화에 집착했던 과거에 ‘헤다’를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을 한국에서 제대로 공연한 역사는 최근 10여 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 일방적인 피해자로서의 여성 서사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권리와 욕망에 능동적이고, 과거보다 많은 것을 쟁취했음에도 여전히 온전한 주체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이 불만족스럽다. 때론 자신을 밀어내는 가부장 체제에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때론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파괴적인 본능의 분출로 불안에 휩쓸리기도 한다. ‘헤다 가블러’에 대한 열띤 반응의 저변에는 이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놀랍게도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직은 없다. ‘헤다’의 타나토스적 기운을 에로스라는 상생의 기운으로 바꿔줄 현명한 리더를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김명화 극작가·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