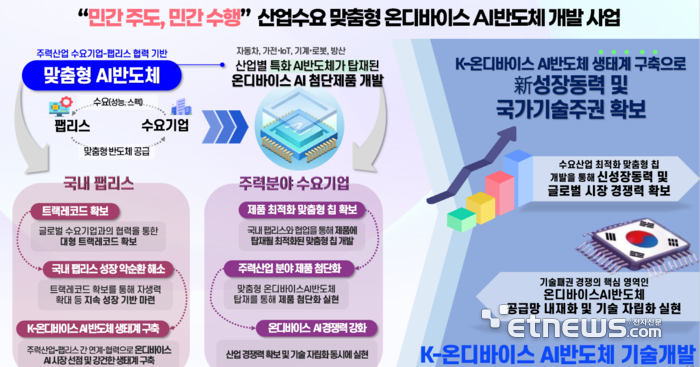“차세대 태양전지로 기대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해왔지만 결국 중국 주도 상용화가 머지않았습니다. 최고 기술 연구는 우리가 다해놓고 시장을 뺏길 위기라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의 세계 최고급 권위자 석상일(사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초빙특훈교수가 21일 울산 울주군 본교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중국 기업 런샤인솔라가 최근 12억 5000억 위안(약 2400억 원)을 들여 GW(기가와트)급 생산라인 구축에 나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GW급 생산 전력은 원자력발전소와 맞먹는 만큼 해당 시설 구축 시점인 1~2년 후면 사실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중국에서 먼저 상용화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이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이어 차세대 기술에서도 밀리게 됐다는 게 석 교수의 경고다.
석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광전(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3%까지 끌어올린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다. 학계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13년 12%를 시작으로 최고 기록을 수차례 경신해왔다. 이 공로로 2022년 영국 ‘랭크상’, 이달 8일엔 독일 ‘훔볼트연구상’까지 세계적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학술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격자 구조를 가진 광물종인 페로브스카이트를 핵심 소재로 쓰는 태양 전지다. 빛을 받아 전기를 일으키는 광활성층을 기존 실리콘에서 페로브스카이트로 대체한 형태다. 실리콘보다 내구성은 물론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석 교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밸류체인이 길고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발전단가는 W(와트)당 24센트인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 한계를 개선해 절반 수준인 10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게는 이 기술 선점이 특히 절실하다. 석 교수는 “중국이 적자를 감수한 가격 공세로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량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했다”며 “한국은 이를 따라할 수 없고 그나마 태생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전체의 50%까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응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도 쉽지 않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지난해 말 중국 방문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의 페로브스카이트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아직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비공식적 수치로 28% 효율을 달성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 업체가 이미 대면적 패널을 갖추고 1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런샤인솔라는 2023년 150㎿급 생산라인에 이어 지난해 GW급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업체 션지안테크놀로지는 실험실이 아닌 대면적 패널 조건에서도 비교적 높은 20.9% 효율을 달성했다.
반면 국내 상용화 진척은 요원하다. 석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그동안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해 얼마나 빨리 상용화하는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실증 시설은 고사하고 이에 필요한 대면적 패널 제작부터 수백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택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지방정부만 수천억 원을 투자해준다”며 “중국뿐 아니라 일본 세키스이가 100㎿ 생산 시설 투자에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TPD 혁신신약계의 ‘앙팡테러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까 [김정곤의 바이오 테크트리]](https://newsimg.sedaily.com/2025/05/20/2GSVEQHEO9_1.jpg)


!["저사양서 AI 모델 최적화"…글로벌 빅테크도 '눈독' [스케일업리포트]](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VE9QAA_4.jpg)

![[그게 뭔가요]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한 AI 유니콘 ‘사카나AI’](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sakana_fish_cover_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