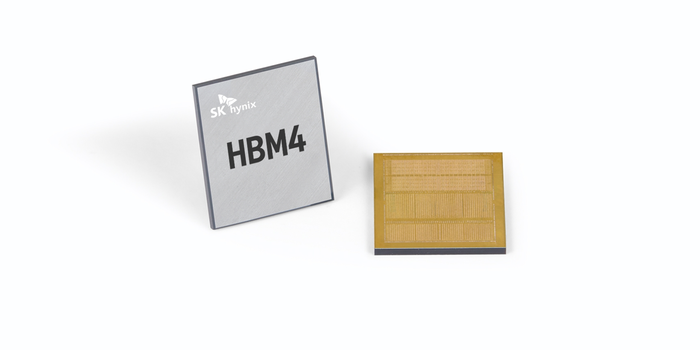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시장 경쟁사다. 양사 모두 D램과 낸드플래시를 만들고,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필수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판매 중이다. 같은 수요처를 놓고 공급을 다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로 견제하면 견제했지 가까워질 수는 없는 사이다. 하지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곳이 비즈니스 세계다. 서로가 필요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다. 맞춤형 HBM 때문이다.
맞춤형 HBM은 이런 거다. 메타, 아마존, 구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AI 서비스를 구현하길 원한다. 남들과 차별화된 AI로 이용자를 사로 잡아야 미래 검색 시장이나 광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남다른 AI 인프라가 필요하다. 타사보다 더 빠른 반도체, 서버,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앞선 AI를 제공할 수 있다. 맞춤형 HBM가 등장한 배경이다. 나만을 위해 특별 설계된 HBM을 요구하는 수요가 생겨났다.
변화의 첫 시작은 HBM4다. 내년 양산될 HBM4는 칩 하단(베이스다이)에 고객사 요구로 로직이 탑재된다. 로직은 연산과 제어가 가능한 반도체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HBM을 만들어 온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TSMC의 힘을 빌린다. 로직 구현 능력에서 TSMC가 앞서서다. TSMC는 2나노미터(㎚), 1㎚ 등 세계에서 가장 미세 회로를 잘 다루는 파운드리 회사다.
맞춤형 HBM을 구현하기 위해 메모리 회사와 파운드리 기업이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는, 바로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력 가능성을 떠올린다. HBM4야 이미 SK하이닉스와 TSMC의 협력 구도가 짜였지만 앞으로 맞춤형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TSMC와 손을 잡아야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첨단 로직 공정을 선도하는 회사가 TSMC다. 그러나 '단독'은 리스크가 크다.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있어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가 아닌가. 공급망을 다변화하지 못하고 의존도가 높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 국내 반도체 업계 모두가 직접 경험한 바 있다. 또 전적인 의존은 종속 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이는 국내 HBM 자생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AI 반도체 산업을 대만이 주도하고 있는데, 차세대 HBM 주도권마저 대만으로 넘어가선 안 되지 않을까.
SK하이닉스와 삼성 파운드리의 협력이 현실화될 지, 터무니 없는 얘기로 끝날 지 알 수 없다.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HBM 주도권이 넘어가는 일 만큼은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단 협력이 성사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삼성 파운드리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TSMC를 뛰어 넘을 정도는 아니어도 대등한 기술력을 갖춰야 맞춤형 HBM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없으면 삼성 HBM도 TSMC에 맡겨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부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란다.
윤건일 기자 benyun@etnews.com

![[기고]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차량 전장 기술 진화를 이끄는 열쇠](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4/news-p.v1.20250724.6da4d79e3b43436aa850b225d8fd806f_P1.jpg)

![하이퍼엑셀, 로봇·가전 겨냥 온디바이스AI 진출… CEO 리스크에 ‘KT·타뱅’ 사업재편 먹구름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JV4Z2K_1.jpg)


![‘HBM 독주’ SK하이닉스 또 사상 최대 실적…삼성에피스, 마일스톤발 실적 악화 방어 성공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5/2GVHJ538SE_1.jpg)
![[GAM]메타 주가 7월30일 '분수령' ① 실적 발표일 AI 중대 발표](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0217368670.jpg)
![[글로벌 핫스톡] 에어로바이런먼트, 드론 등 생산…글로벌 군비확장 수혜](https://newsimg.sedaily.com/2025/07/24/2GVH53RN1L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