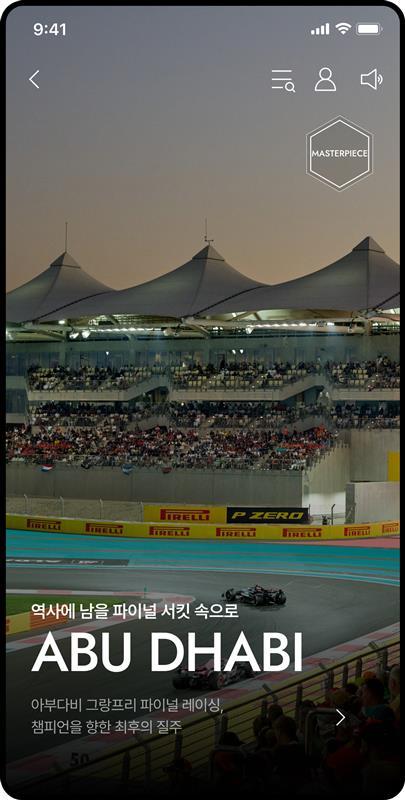남편과 함께 전라감영 앞을 걷던 어느 날이었다. 입춘을 맞아 내리던 이른 봄비가 감영의 담장 위로 경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차에, 남편이 말했다.
“만약 지소(紙所)가 남아 있었다면, 오늘날의 문구점 같은 공간이었을까?”
2024년 2월, 그가 던진 말에서 우리의 문구점은 시작되었다.
지소(紙所)는 전라감영 안에 있던 공간으로, 한지를 만들고 관리하던 곳이다. 전주는 오래전부터 한지의 고장이었고,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다. 지소(紙所)는 종이를 생산할 뿐 아니라, 종이를 통해 지역을 움직이던 중요한 장소였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종이로 부채를 만들고, 서적을 펴냈으며, 완판본이 탄생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전주의 장면 하나에서 시작된 말들이 어느새 공간이 되고, 프로젝트가 되고, 가끔은 진짜 일이 되기도 했다. 전주 특산물을 활용한 잼과 페스토, 요리책을 함께 파는 작고 귀여운 상점, 우리가 좋아하는 오래된 식당과 장소를 소개하는 로컬 매거진, 집에 묵혀둔 책을 들고나와 전주천이나 남천교에서 함께 읽는 모임처럼.
지소(紙所)도 그런 줄 알았다. 찰나의 상상에서 시작된 단편적인 기획들, 순간엔 활활 타올랐다가 휘발되는 우리만의 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짧은 대화로 시작된 생각은 몇 날 며칠, 몇 개월 동안의 시간을 지나며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지소’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 어떤 풍경이 담기면 좋을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지소(紙所)를 재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왜 문구점을 떠올렸을까?’, ‘전주의 한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지 않고 머리를 맞대며 빠짐없이 생각을 나누었다.
즐겁고 때론 진지했던 우리의 놀이는 마침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반쯤은 의심에 덧댄 계획서였고, 반쯤은 진심이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2차 심사를 위한 발표문을 작성할 때도 ‘설마 진짜 되겠어?’ 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했다. 최종 선정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들었던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한다는 실감이, 생각보다 묵직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이야기들이 실재하는 공간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만든다는 일. 그건 설레는 동시에 조금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우리의 문구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소(紙所)가 종이를 다루며 지역과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그 위에 남겨질 이야기를 다루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생각해 보면 문구점은 단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나의 ‘취향’으로 ‘선택’을 해보는 곳, 방과 후 친구들과 몰려가 시간을 보내거나, 때론 경건한 마음으로 물건 하나하나를 깊게 탐구하던 곳. 누군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지를 고르고, 무언가 꼭 사지 않고 그저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작은 활력이 되던 곳.
지소(紙所)가 종이를 통해 지역과 사람을 잇던 것처럼, 우리는 문구점에서 그 마음을 다시 엮어가기로 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
△김채람 기획자는 지역이 가진 자원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기획과 아카이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수집가를 위한 기록상점 ‘클립어데이’를 구도심에 오픈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감영 지소 #문구점까지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신간] 앞으로 읽고 뒤로도 읽는 그림책 '앗, 자전거'](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09043309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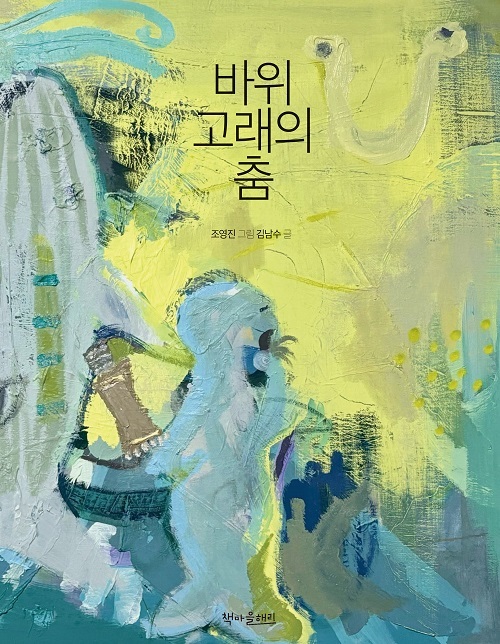
![[아이랑GO] 알쏭달쏭 친구 관계 고민, 해결책을 찾아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8cd1420a-dc51-4d0d-8614-9801ddb138d4.jpg)
![[Biz-inside,China] '소셜 화폐'로 진화한 장난감…중국 감성 소비가 키운 아트토이 시장](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7/4542e115-f28a-439c-ab45-a1fe0b34ecf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