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원전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그 깊은 몸부림(deep sea and deep roaring)”이라는 묘사로 자연의 힘과 공포를 마주한 인간의 불안과 경외심을 표현했다. 종교가 지배한 중세, 단테의 '신곡'은 종교적 심연과 고통을 '깊은 지옥(deep hell)'으로 불렀다.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인간의 깊은 정신적, 윤리적 고뇌를 이야기했다.
딥러닝(deepLearning)과 딥페이크(deepFake)에 이어 중국에서 출몰한 딥시크(deepSeek)까지 '딥 시리즈'의 충격파가 요란하다. 몇 년 전 의료계에 화제를 일으킨 된 IBM의 '닥터 왓슨'도 원 프로젝트 명은 'deepQA', 즉 깊은 질의응답이었다. 이제 컴퓨팅 관련 하이테크 분야에 자주 등장하는 이 'deep~' 시리즈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궁금해할 때가 됐다.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의 딥마인드(deepMind),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딥페이스(deepFace), 고성능 번역엔진 deepL, 음성인식 딥스피치(deepSpeech), 그리고 한국의 딥브레인(deepBrain)과 딥서치(deepSearch) 등 '딥 시리즈'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딥 시리즈'가 대중화된 계기는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교수의 '딥러닝'이었다. 2006년 논문에서 그의 'Deep Belief Network' 연구가 '딥러닝'으로 소개됐고, 2010년대 GPU 등 컴퓨팅 발전과 맞물리며 급속히 팽창했다. 한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딥 시리즈'의 역사는 깊고 유구하다. 1997년은 체스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AI '딥 블루'가 꺾은 해다. AI 최초로 인간을 꺾은 공식 승전보다. 카네기멜론의 대만계 미국인, 수 박사가 만든 체스 AI의 이름은 '딥소우트(Deep Thought)'였고, 그 가치를 알아본 IBM이 사들여 발전시킨 '딥블루'가 카스파로프를 꺾은 것이다. 즉, 컴퓨팅 분야 '딥 시리즈'의 시초는 '딥소우트'다.
그럼 '딥소우트'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더글라스 아담스의 코믹 SF,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1979)'에 등장하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초지능 슈퍼컴퓨터'의 이름이다. 농담처럼, 수 박사는 자기 프로그램을 '딥소우트'로 명명했다. 아담스가 풍자한 것은 '무조건적 정답 찾기와 과학숭배, 기계가 모든 답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은하계의 어떤 초지능 문명이 '궁극의 정답'을 구하기 위해 '딥소우트'를 만들었다. 인류는 750만년 동안의 연산을 통해 '생명과 우주와 세상만물에 대한 궁극의 정답(The Answer to the Ultimate Question of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을 알아내려 했다. 연산이 완료되는 바로 그날, '정답'을 받으려 구름떼처럼 몰려든 사람들에게 '딥소우트'가 답했다, “정답:42” “엥? 그게 무슨 답?” 소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내 계산은 정확했고, 모든 오류는 확인됐고, 결과는 완벽했다. 정답: 42.” “…음, 그런데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그 '질문'이 원래 뭐였었는지를 알기는 했었나?”
인류는 드디어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임을 깨닫고 '그 궁극의 질문'을 찾기 위해 더 큰 컴퓨터를 만들었다. 결국 지구 폭파로 인한 은하계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 코믹 SF다. '문제' 없는 '정답'은 허망하다. 기계는 수치연산은 잘 하지만 '의미'는 모른다. 이 '너무 깊은 생각(Too Deep Thought)'이라는 '딥 풍자'가 AI 분야에 깊이 자리잡는다. SF 문학에서 시작된 AI 분야의 '딥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달마대사(?)가 깨달음에 손바닥으로 이마를 빡 쳤다'는 속설로 '충격과 깨달음'을 의미하는 '빡침'이라는 젊은이들의 신조어도 최근 그 '딥 버전'인 '딥빡'으로 회자된다. '깊은 깨침' 정도 되겠다.
최초의 SF 소설인 '프랑켄슈타인'에서 'deep sleep'으로 등장한다(1816). 괴물을 창조한 충격과 공포로 박사는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진다. 하이테크 SF 소설이 잠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낭만주의적 서사를 사용했다는 점은 흥미롭게도 셰익스피어에서 '햄릿'의 독백,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잠드는 것(To die: to sleep)'이라는 인간 존재론적 고뇌에 깊이 닿는다. 우리 삶의 방식에 과학기술 발전이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탄생한 '사람과 기술' 사이의 깊은 관계에 대한 '깊은 깨침'이다.
김주한 서울대 의대 정보의학 교수·정신과전문의 juhan@snu.ac.kr
![[기고] 연세대, 양자 컴퓨팅 상용화 박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3ee07fac-e2b0-49d3-8343-9c6868a2c472.jpg)

![삼성·젠몬 협업 구글 AI 글래스 "자비스 멀지 않았네" [잇써보니]](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TSLPNA_3.jpg)

![[타인적인 일상] 말에 올라탄 인생](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859450158_fa1fd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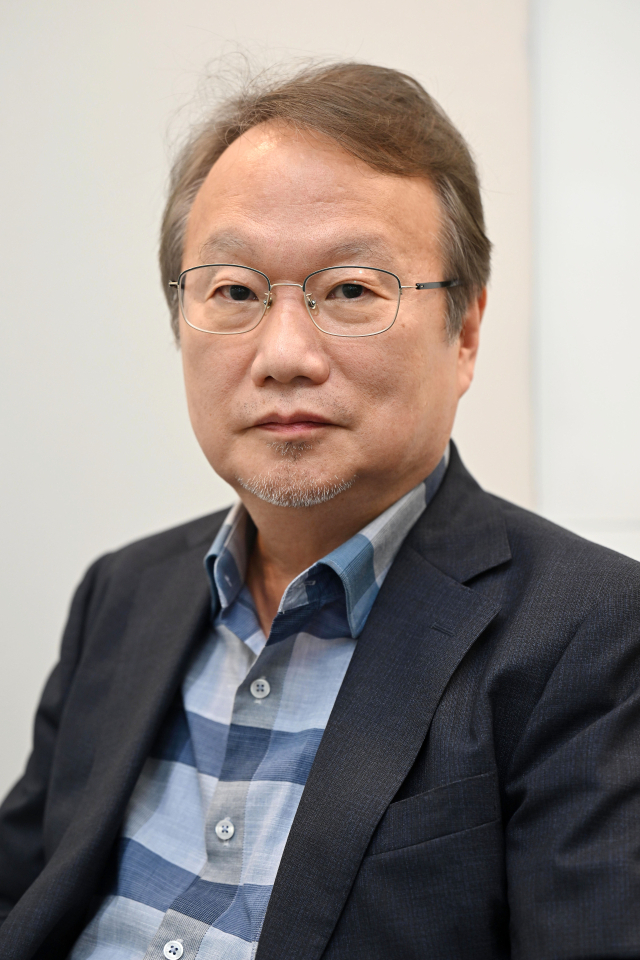
![“AI 검색으로 더 많은 맥락과 연결”…피차이 구글 CEO의 전략은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2/562e1b82-d09b-4b57-a9bb-b385787a264f.jpg)
![[팩플] 삼성·젠틀몬스터 손 잡은 구글...10년 전 ‘구글 글래스’ 굴욕 씻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1/d86e454a-2232-49af-bf38-f2e8d2665a8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