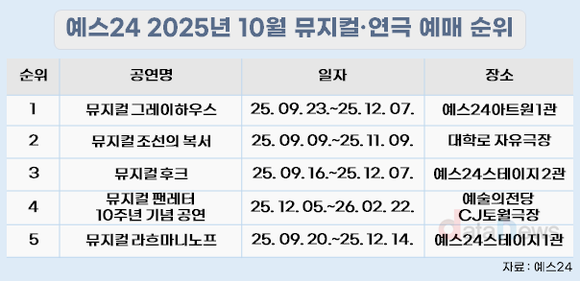‘목줄을 끊으려는 여성들에게’ 최연정 감독
외모 꾸밈 압박 해방 실천기 다뤄
해외 영화제서 6관왕 수상 쾌거
미술 강사로 8년 일하다 韓 떠나
“체중 감량하는 아이들 보고 각성
탈코르셋 여성들 공격 않길 바라”
“왜 여성에게 긴 머리가 당연한지 묻고 싶었어요. 잔잔한 호수 같은 일상에 작은 돌 하나 던져보자 한 거죠.”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한국 여성들의 실천(탈코르셋)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국제적인 반향을 얻고 있다. 영화 ‘목줄을 끊으려는 여성들에게’는 한국 여성의 당사자성을 가진 최연정 감독이 “탈코르셋을 거부감 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다. 지난해 말 공개 이후 지금까지 파리 여성 씨네페스트, 허(Her) 비전 필름 페스티벌, 런던 여성 영화제, 마이애미 여성영화제 등 6개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알렸다. 유튜브에서는 5일 현재 조회수 40만, 좋아요 4만개를 훌쩍 넘겼다.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최 감독을 지난 2일 화상 인터뷰로 만났다. 독립 영화감독이자 비주얼 스토리텔러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는 한국에서 입시 미술 학원 강사로 8년간 일하다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올해 초 호주행을 감행했다. 영화 감독에 대한 거창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든” 첫 작품이 예상 밖의 관심을 받으면서 영상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다소 충동적이었다. 여느 때처럼 혼술하며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성형을 다룬 한 넷플릭스 작품에서 화가 났다고 한다. 최 감독은 “성형한 여성들이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탈코르셋으로 보였다”며 “해외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 아무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게 답답했다”고 했다. 즉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코르셋 다큐를 만들 계획인데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그렇게 촬영 2명, 공동 시나리오 1명, 편집 1명의 초기 인원이 모였다. 이후 팀 구성에는 변동이 생겨, 막바지 편집과 작화는 최 감독이 혼자서 수행했다.
애초에 해외 시장을 노린 것도 아니었다. 내레이션을 맡길 사람을 고민하다가, 민감한 주제 탓에 보복이나 신상 위협의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AI) 성우로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왕 AI가 한다면 영어로 읽게 하자”고 한 것이 주효했다. 최 감독은 “의도치 않은 국제 타깃화 효과가 있었다”며 “영어 댓글이 많이 달리고, 시청자층 분석에서 미국 비중이 10%가량 되는 걸 보고 해외 반응이 확실히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최 감독의 영상들에는 직접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오래 가르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며 바나나 하나와 블루베리 몇 알만 먹는 장면을 자주 봤다”는 그는 “지금 안 바뀌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상했다. 이 작품에서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당신 역시 ‘문제의 일부’가 된다”는 대사는 그렇게 등장했다.
이런 극단적인 현실은 최 감독이 일상 속 여성이 겪는 성차별을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다. 자신과 같은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여성의 변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으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최 감독은 “한국의 여성혐오가 독보적으로 심각하다는 점, 한국 여성들이 똑똑하고 실천력이 있다는 점이 접목된 결과 같다”고 분석했다.
이 작품에 대한 국내와 해외 반응의 결이 다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해외에서는 대체로 “한국의 여성혐오적 현실에 맞서는 여성들의 실천에 연대한다”는 반응 위주라면 국내에서는 지지와 반발이 갈리는 양상이다. 꾸미지 않는 상태를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일부 여성의 거부감에 대해 최 감독은 “저도 ‘틴트 안 바르고 편의점 갈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과한 부담을 갖지 않되,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여성을 공격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 작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경우도 목격했다고 최 감독은 말했다. 자신을 보고 호주에 있는 다른 한국 여성들이 탈코르셋을 실천했다거나 페미니즘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다는 반응들이 그렇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상징인 ‘목줄’은 최 감독이 탈코르셋을 처음 접하던 시기에 본 페미니즘 만화인 ‘애완 인간’, 코르셋 끈을 끊어내는 장면이 나오는 ‘탈코일기’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여성들이 목줄을 잘라내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최 감독은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뇌과학 관련 글을 본 기억이 있다”며 “반복된 패턴을 깨면 뇌는 불편함을 느끼니 대부분 편안한 길에 안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을 통해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최 감독은 ‘2026년’의 의미에 주목하는 첫 장편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 그는 “예전에는 ‘내 실력으로 될까’ 하는 자신감 부족이 장애물이었는데, 좋은 반응이 계속 오니까 더 도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다음 작품은 내년에 꼭 만들어야 해서 곧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