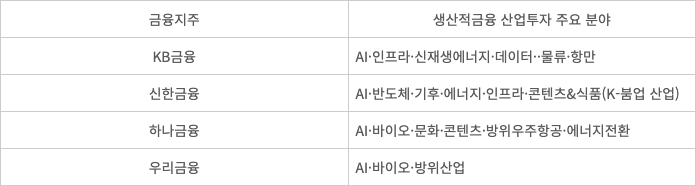국내 은행권이 정책보증기관에 내놓은 특별 출연금액이 코로나19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에 특별 출연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은행권이 이들 세 기관에 낸 특별출연금과 임의출연금은 총 69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특별·임의출연금(7099억 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3603억 원)과 비교하면 1.9배나 많다. 세 보증기관이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특별·임의출연금은 △2021년 3746억 원 △2022년 3475억 원 △2023년 5117억 원 등으로 상승세다.
금융기관이 정책보증기관에 내는 출연금은 크게 법정출연금과 특별·임의출연금으로 나뉜다. 법정출연금은 각 금융기관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특별 보증부 대출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각 보증기관에 특별·임의출연금을 출자하기도 한다.
올해 들어 특별·임의출연이 많았던 이유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용 금융 상품을 내놓으려는 은행권의 수요가 유독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 정부에서 포용 금융을 강조하면서 선제적으로 정책보증기관에 자금을 넣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대출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관련 대출을 늘릴 때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넣는 대신 원금의 85~90%를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상품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중소기업 금융 담당자는 “올해에는 특별출연을 토대로 정책보증기관이 원금을 100% 보증해주는 상품도 꽤 늘어난 모습”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각지 소상공인에 정책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보에서 유독 임의출연금이 많았다. 지역신보에서는 올해 1~9월에만 4720억 원의 임의출연금이 들어와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실적(4477억 원)을 5.4% 웃돌았다.
기보와 신보도 마찬가지다. 각 은행이 올해 1~9월 기보에 낸 특별출연금은 957억 5000만 원이다. 지난해 전체 특별출연금(735억 6000만 원)과 비교해도 30%나 많다. 신보에는 올 9월 말 현재까지 1261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들어왔다. 지난해 연간 실적(1886억 원)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연간 300억~970억 원 수준이었던 2019~2023년과 비교하면 최대 4배가량 많다. 이를 바탕으로 기보·신보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총 4조 1201억 원의 협약보증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정출연금까지 고려하면 은행권이 세 정책보증기관에 낸 출연금은 2년 연속 3조 원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3개 정책보증기관에 들어온 법정·특별·임의출연금은 총 3조 308억 원을 기록해 전년(2조 5603억 원)보다 18.4%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정책보증의 구축 효과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7~9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집행한 개인사업자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8~3.88%로 4.41~5.8% 수준인 신용대출에 비해 1~2%포인트가량 낮다.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으로 정책보증기관 출연금이 늘어나면 각 금융기관의 경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상생 금융의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은행권의 경영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될 것”이라며 “현 정부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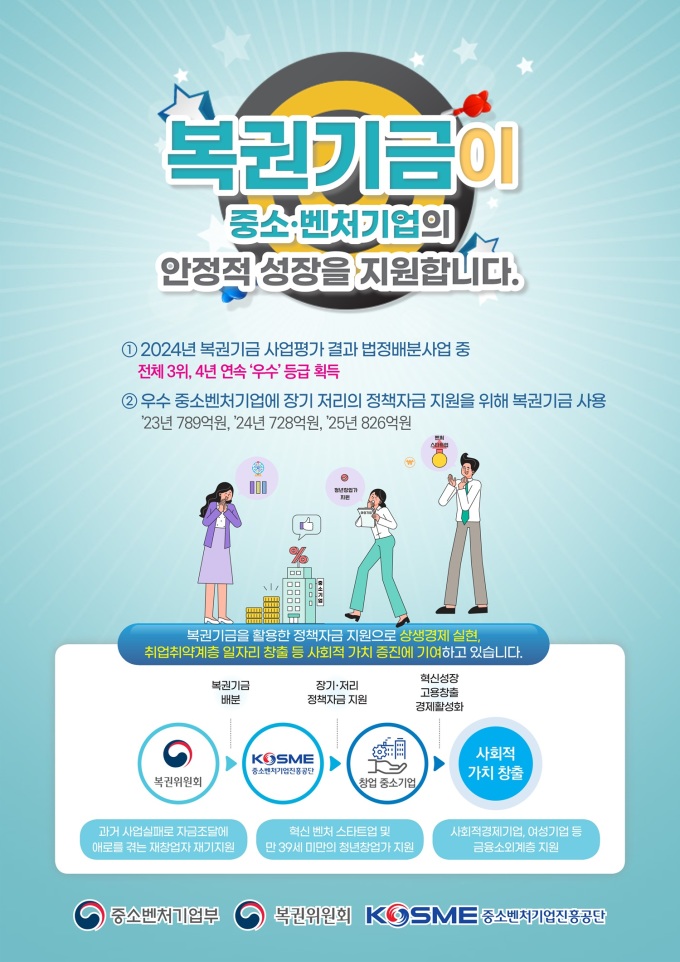




![[단독] "신용·담보 안 따져"...쿠팡 대출 베일 벗었다](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6360750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