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안미경중(安美經中) 대신할 ‘세 개의 삼각형’ 전략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끝났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분류법은 이제 설 자리를 잃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그리고 첨단산업의 안보가치 증대라는 흐름 속에서, 안보와 경제는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융합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입에 익었던 사자성어 하나를 폐기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현장은 혼란스럽다. 치열하다는 중국 시장 속에서도 성장의 가능성과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우리 기업들조차, 막연한 불안감 속에 그 가능성을 내려놓는다. 도전의 포기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첨단 과학기술 영역은 미국 등 선진국과 전략적 연계 강화를
안보·경제 민감성이 낮은 기초과학 연구는 중국과도 협력을
과학기술과 사회경제 융복합이 이뤄지는 인간의 영역 중요
도발적 아이디어가 체제 경직성에 막히지 않는 한국이 유리
그렇다고 무턱대고 중국 진출, 한·중 협력 극대화를 독려할 때도 아니다. 막연한 불안감만큼이나 막연한 기대는 현명한 전략적 대응이 아니다. 우선 할 일은, 현장의 혼란과 막연한 불안감을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안미경중’은 그 자체로 어설프고 부정확했지만 ‘단순함의 미학’까지 발휘해가며 빠르고 과감한 행보들을 현장에서 뒷받침했었다. 이제 그를 대체할 현장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혼란과 막연한 불안감,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상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되 발전적 지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어디서든 이윤 창출의 미시적 기회를 포착·추구하는 데 기업만한 주체가 있을까마는, 그들이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거시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삼각형 영역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세 개의 삼각형’ 전략(Triple Triangle Strategy)이다. 우리의 국제적 협력·경쟁 공간에 삼각형 모양의 3개 영역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세 곳에서 전략적 중점과 행동 방식을 구별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구별은 더 왕성하고 활기찬 행동을 가능케 하리란 점에서 유익하다.
그럼, 세 개의 삼각형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시각화를 위해 필자가 밑그림으로 활용한 것은 2022년 미국이 대중 기술통제의 전략적 원칙으로 제시한 ‘작은 영역,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이다. 그 밑그림 위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삼각형 영역을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그림 참조〉.
첫째, 하이 펜스(high fence)가 둘러쳐진 스몰 야드(small yard) 안쪽에서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첨단 과학기술의 영역이다. 항간의 관심이 온통 쏠리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 세밀한 구조는 이렇다. 스몰 야드는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가 확대·강화되면 그에 따라 더 넓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뜰(야드)의 전체가 아닌 일부다. 또한 펜스가 높다지만, 현재의 치열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미래 지향의 일일수록 펜스가 제약하는 영역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요컨대, 하이 펜스의 실제 모습은 굴뚝처럼 아래가 넓고 위는 좁은 구조다. 그런 굴뚝 안에 첫 번째 삼각형이 놓여 있다〈그림 속 1번 삼각형〉.
둘째, ‘현재의 바닥’에서 굴뚝 모양의 하이 펜스를 따라 올라가면 ‘미래의 상공’ 굴뚝 외벽에 인접한 두 번째 삼각형이 있다〈2번 삼각형〉. 첨단 과학기술의 영역이긴 하나, 당장 현실의 치열한 경합이 이뤄지지는 않는 미래 지향의 영역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다투기엔 아직 이른 기초과학 연구, 경쟁 이전(pre-competitive) 단계이거나 공공·공유를 지향하는 기술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하이 펜스가 쳐진 스몰 야드 바깥쪽에 가로로 누운 널찍한 삼각형이 있다〈3번 삼각형〉. 과학기술 지상주의, 기술입국론에 과몰입한 한국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용과 사회경제의 활력을 떠받치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 삼각형의 내부는 혼성적, 융합적이다. 하이 펜스에 가까이 외접한 영역은 과학기술의 함량이 높고, 그 반대쪽 영역은 일반 사회경제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전체적으로는,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영역이 이 세 번째 삼각형이다.
세 번째 삼각형의 중요성
그런데, 첨단 과학기술에 가까운 것만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의 눈엔 세 번째 삼각형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전략 담론 속에서도 세 번째 삼각형의 존재는 흐릿하다.
하지만 세 번째 삼각형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학기술, 특히 AI와 로봇의 진전 속에 위축될 수도 있는 인간 고용과 인간의 역할을 되살릴 수 있는 주된 장(場)이기 때문이다.
첨단 과학기술은 더 나은 기능과 효율을 가진 새로운 것으로 기존의 것을 폐기한다. 혁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인류는 그러한 혁신에 환호해왔지만, 처음 그 혁신론을 펼쳤던 슘페터(Schumpeter)도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종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했다.
그 비관에 갇히지 않으려면, 앞으론 ‘창조적 파괴’를 넘어 ‘창의적 창조(Creative Creation)’를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디자인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주된 공간이 바로 세 번째 삼각형이다.

최근 한국에는 ‘쉬는 청년’, 중국에는 ‘드러누운(탕핑, 躺平) 청년’이 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스스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어가는 것이다. AI, 로봇 과학기술로 세상은 발전한다지만, 일자리의 양극화, 중간지대의 공동화도 심화시킬 것이다. ‘창의적 창조’로 인간의 역할 공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지 않으면 더 많은 청년이 갈 길을 잃을 것이다. 하여 세 번째 삼각형은 중요하다.
특히, ‘창의적 창조’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창의성’이다. 도발적 아이디어가 체제의 경직성에 가로막히지 않는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이다. 한국에선 그만큼 더 큰 의미가 세 번째 삼각형에 부여되어야 한다.
각 삼각형의 초점과 지향
세 개의 삼각형을 실제 전략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세 삼각형 영역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초점과 지향을 갖춘다는 뜻이다. 하나씩 보자.
첫 번째 삼각형은 안보 차원에서도 민감한 첨단 과학기술 영역이다. 이 삼각형 영역에서 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들과 전략적 연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안보에 모순을 일으키지 않되,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성과가 가장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대의 글로벌 시장 접근권(maximum global market access)’ 확보가 핵심적 추구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추구 속에서 한국은 자체 지식재산(IP)을 축적하고 글로벌 영업권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삼각형은 장기 기초과학 연구, 공공·공유 기반의 기술 개발 영역이다. 이 또한 첨단 과학기술 영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안보·경제 민감성이 낮은 영역이다. 이곳에선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왕성하게 펼치는 것이 좋다. 관통하는 원칙은 ‘개방성’이다. 과학기술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교류·협력도 배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에서도 배우고,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해 두는 것이 좋다.
AI가 못하는 인간의 ‘놀이’ 개척을
세 번째 삼각형은 사회경제의 활기와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할 창의적 창조의 공간이다. 이곳에선 ‘다양성’, ‘지역성’, ‘공존’이 존중된다.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은 다름을 포용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을 이끌 선도적 지위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활발한 소통과 교류 속에서 말이다. 이곳은 안보 차원의 민감성은 낮지만, 비즈니스의 경합은 있는 곳이다.
한국은 참여와 민주, 역동성에 ‘창의성’을 더해 이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선도해야 한다. AI·로봇이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인간 특유 ‘놀이(스포츠, 레저)’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더 넓게 개척하고, 소소한 혹은 대범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사회경제에 구현하고, 인간의 감성적 터치가 주효할 예술과 치유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허리띠 졸라매고 앞만 보고 뛰며 모방자·추격자로 살아온 탓에 내재한 창의성이 빛바랬다면 그를 되살릴 사상가와 실천가가 모인 논의의 장부터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 미리 이름부터 제안하자면, ‘CCTPB(Creative Creation Thinkers and Practitioners’ Board)’가 어떨까.
최근 과학기술 성과에 자신감을 붙여가는 중국도 사실 사회경제적 동력의 약화와 고용 창출의 문제로 속앓이한다. 무언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증량(增量) 공간’을 찾고 있지만, 체제 특성상 제한적인 듯하다. 한국이 더 창의적으로 나아가자.
은종학 국민대 교수·현대중국학회 회장·칭화대 기술경제경영학 박사


![투자 줄어들까 조바심? 트럼프 “외국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아”…“美, 금융위기 아니면 안해주는데” 연준 상대해야 할 韓銀 ‘곤혹’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JRF4I_1.jpg)
![조동철 KDI 원장 “민간이 뛸 수 있게 AI 규제 풀되, 정부는 기반조성 힘 쏟아야” [세계초대석]](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1622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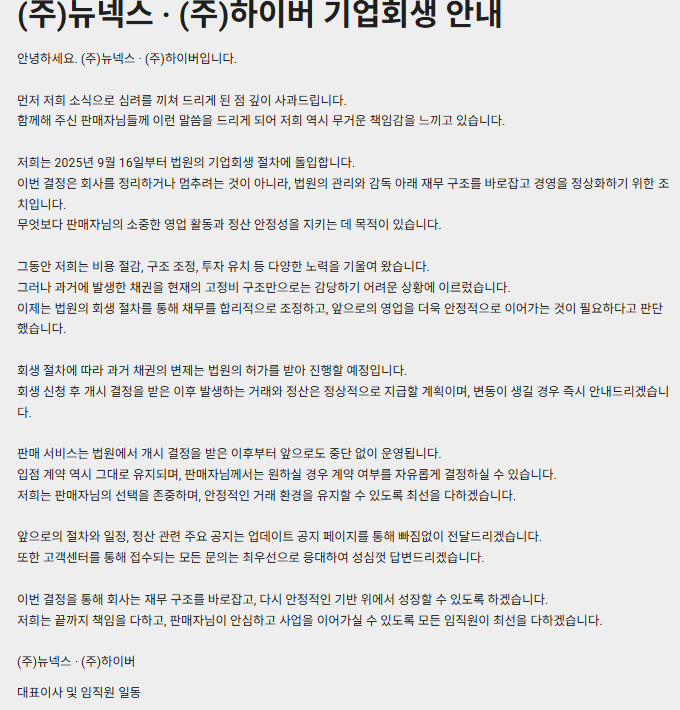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러다이트 운동’](https://newsimg.sedaily.com/2025/09/18/2GXY6E44US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