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유령작가였을 때/그때 나는 아직 한창때였고 이름 없이도 아니 이름이 없어서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었다”
황유원(43) 시인이 지난달 31일 낸 시집 『일요일의 예술가』(난다)에 실린 시 ‘에어프랑스’의 한 구절이다. 그는 무명작가이던 시절, 한 웹진에 이름 없이 광고성 에세이를 연재한 경험을 이렇게 풀어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시인은 “시집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 표지에도 이 시를 실었다”고 말했다.

시집의 제목인 ‘일요일의 예술가’는 시인이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별명인 ‘일요일의 화가’를 잘못 기억해 언젠가 시집의 이름으로 쓰고자 마음먹었던 표현이다. ‘일요일의 화가’는 평일에는 주업인 세관원에 종사하다 주말에만 그림을 그렸던 루소를 사람들이 ‘아마추어 화가’라고 여겨 생긴 별명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유령작가”였던 것은 “계약상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받아들이며, 사실 유령작가로 글을 쓴 일은 “자의식 비대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웃어넘긴다. 없던 여행 경험을 지어내어 에세이를 써야했음에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에어프랑스를 타고 허공을 가르며/(중략)/그곳에서 참 행복했다”고 회상한다.

아무리 무명작가라도 이름을 지우고 글을 쓴다는 건 작가로서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시인은 주어진 상황에 새 의미를 부여했다. 루소처럼 ‘먹고살기 위해’ 감내했던 일이기 때문일 테다. 게다가 시인은 ‘존재란 무엇인지’를 꾸준히 물으며 시 세계를 일궜다. 유령으로 살아본 경험이 그의 시 세계를 더 풍성하게 해준 셈이다.
지금 시인의 생업은 번역이다. 2013년 등단 이후 다섯권의 시집을 펴낸 동안, 번역 경력도 비슷하게 쌓였다. 『모비 딕』(2019), 올해 부커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솔로이의 『올 댓 맨 이즈』(2019), 『폭풍의 언덕』(2022),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앤 카슨의 시집 등 수십권의 책을 번역했다. 특유의 문학적 시선과 유려한 문체를 살린 번역에 ‘황유원 번역본’을 따라 읽는 독자도 생겼다.
시집엔 예술가의 이야기가 유독 많다. 시인은 미국의 재즈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의 ‘마이 페이보릿 띵스’(My Favorite Things) 연주를 언급하며 예술이란 뭔지 생각해보다(‘My Favorite Things’), 한국의 원로가수 최백호의 공연에서 예술가의 손에 스민 세월을 가늠하기도 한다.(‘백호의 손’)
“쓴 시중에 예술가가 등장하거나 예술이 소재가 된 시들을 모았어요. 시를 쓰고 돌아보면 자연히 예술가들이 호명되어 있더라고요.”

전작 시집 『초자연적 3D 프린팅』(2022), 『하얀 사슴 연못』(2023) 등에 이어 ‘종교적’인 시들도 눈에 띈다. 그는 “학부 시절 고(故) 길희성 교수의 강의를 통해 힌두교를 비롯한 인도의 종교 전통·문화에 푹 빠졌다”며 “특정 종교를 믿는다기보단,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존재’란 무엇인지 꾸준히 질문하는 종교적 태도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강대에서 종교학·철학을 전공했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요일의 예술가』는 출판사 난다의 시인선 ‘난다시편’ 2권으로 소개됐다. ‘난다시편’ 시집에는 한국어를 모르는 독자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된 시가 한 편씩 실려있다. 시인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황 시인이 고른 시는 역시 ‘에어프랑스’였다.
“내가 유령작가였을 때/그때 나는 아직 한창때였고 이름 없이도 아니 이름이 없어서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었다/산 존재는 절대 못 느끼는/이름 있는 자는 감히 근접하지 못할/유령만의 새하얀 베일 같은 기쁨 속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 구절을 신인 번역가 최민지씨는 이렇게 번역했다. “When I was a ghostwriter/Then I was in my heyday and I could fly anywhere without a name/or rather because I had no name/I could stay inside the snow-white veil-like joy reserved for ghosts/that a living person can never feel/that a named person can never approach”

“번역가로서, 번역본을 보고 놀랐어요. 제 문체를 따라 번역해주신 게 느껴져서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이제 황유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더 많은 기쁨을 채우려 한다. “시를 쓸 때 쏟아내며 쓰거든요. 책을 내고 나면 ‘0’의 상태가 되었다가, 이렇게 번역가, 기자, 독자들을 만날 땐 책이라는 존재가 1부터 다시 차올라요. 시는 저에게 낯선 사람들과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 또는 문 같은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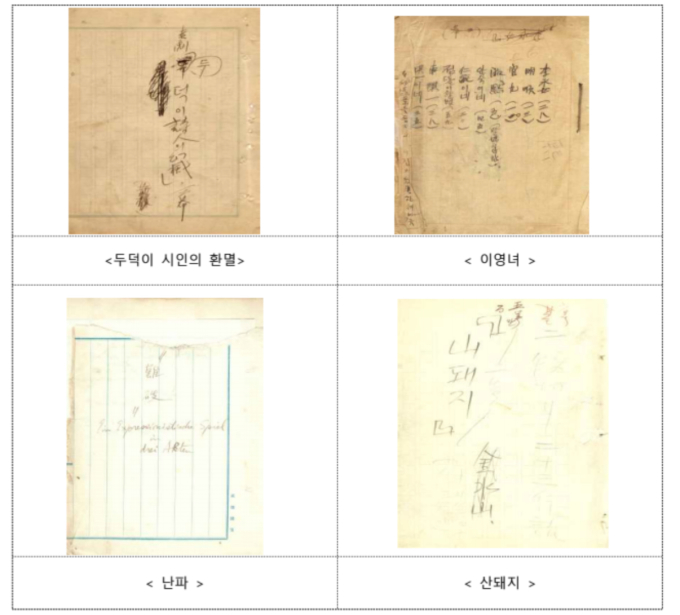

![[북스&] 소설가들의 소설가, 매큐언의 신작](https://newsimg.sedaily.com/2025/11/14/2H0GA98LTC_1.jpg)


![[오늘의 전시] 바닥에 흩어진 조각을 자신의 감각으로 재배열하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0055603168_1352e2.png)
